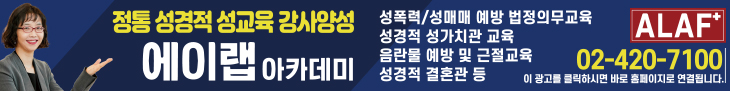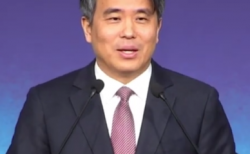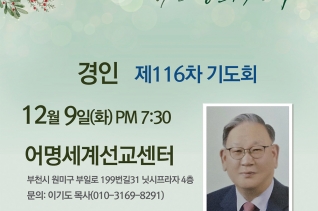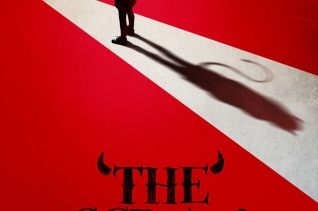정치신학이란 용어는 현대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고 연구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단편적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신학화 한 인물은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2024) 이다. 몰트만은 (나치 히틀러) 독일군이었었는데, 연합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 수용소 생활을 하다 기독교에 관심, 석방된 후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자가 된 인물이다. 신학자가 되기까지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의 윤리신학, 그리고 독일 신학자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의 영향을 받아 그 후 자신의 신학을 조직, 체계화하여 활동하였다.
그의 신학, 즉 정치신학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신학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근본신학이 말하는 속죄적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버림 받은 자들을 대변하는 형상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듯이, 버림받은 자들이 겪는 고통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내용을 신학화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이나 죽음은 외형상으로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정치논리에 희생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결코 정치와 무관 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흔히 바른 신학적 사고관을 갖지 않으면서 비성경적 계시성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통의 길로 몰아 넣는 것이며, 동시에 십자가에 처형하는 결과와 같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몰트만은 이러한 신학적 논조 속에서 “희망의 신학”을 저술 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신학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책을 저술했다. 정치신학 하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몰트만의 신학을 말할 수 있다.
몰트만의 정치신학 사상은 남미의 해방신학에 영향을 끼쳤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몰트만의 자유, 인권, 인간존엄 및 바른 경제질서 제시와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다. 오랫동안의 군부독재, 그 안에서 계속되는 경제적 불평등, 외국 자본주의에 의한 자원 유출같은 것과 더불어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여 고통을 받게 되었다. 남미의 정치 경제적 부정부패로부터 인간 존엄성 및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해방운동이다. 그런 단체들이 1960년대 약 500여 개나 되었다. 이러한 운동에 자극받아 나타난 신학이 해방신학이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다분히 정치논리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신학이라 할 수 있다.
해방신학의 바람은 한국에도 불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의 한국의 민중신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신학은 해방신학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한국적 정치상황에 맞게 고정하여 신학화 하였는데, 그것이 민중신학인 것이다. 첫째, 남미의 해방신학은 정치권력제도가 신학주체 대상이어서 바른 제도실행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같은 것에 신학적 중점을 두어 혁명이나 폭력불사도 방법론으로 용인했는데, 한국은 고난받는 민중, 민초, 변두리 인생,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신학구성의 근간으로 하였다. 그래서 민중신학인 것이다. 둘째, 해방신학은 마르크스 사상도 일정부분 수용하는 입장이었지만, 민중신학은 마르크스 색갈은 철저히 배격하는 입장을 취한 신학을 하였다. 마르크스 사상을 가진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경계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철저히 분리한 관계를 해야 했고, 또 성경,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 교회를 부정하는 자들과 일맥상통하는 학문, 신학을 할 수 없었고, 또한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민중신학이 민중중심의 신학에서 정치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했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민중신학 비판자들은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며, 마르크스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인본적 신학으로 세속적 문화에 너그러운 하나의 운동일 뿐이기 때문에 신학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마르크스 사조도 대담하게 다룬 서구신학의 분위기 속에서 신학을 한 몰트만의 신학 사상도 해방신학의 틀을 거쳐 민중신학에도 실낱같으나마 연결, 또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민중신학은 1970~80년대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던, 즉 정치사회 전반에 존재했던 불의나 부정, 비민주주의 상황을 타파하는 노력을 해 냈다고 하는 것에 큰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지금의 정치신학의 기조는 대부분, 인간존엄성 존중, 권리행사, 모든 인류는 동일한 자유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보수성향의 교회나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인본주의 신학이라 치부하여 비판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그러한 신학의 중심주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얼마나 국가의 시민들이 정치적 탄압이나 억압을 받아 왔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역사는 큰 틀에서 나타난 사건만 다룬다. 그 사건 뒤에 존재하는 약자들이 겪은 비극이나 불행은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에 의해 역사에 가려져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셀 수 없을 만큼 역사 뒷면에 존재해 있다. 21세기 정치신학은 군주, 왕,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얼마나 국민을 희생시킨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를 밝히는 일을 한다. 오늘의 정치신학은 제국주의, 식민통치, 전쟁, 학살, 억압, 인간차별 같은 행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는가 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신학은 이러한 역사적 비인간화에 대한 개선을 주제로 하는 신학을 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생 프랑스 철학자 재키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철학이 할 일 거리가 없어 나온 것이 아니다. 인간을 짖누르거나 권력적 폭력을 중심으로 통치하려는 악한 구조나 제도, 전통이나 관념을 해체시켜 없애 버리자는 입장에서 해체주의 철학이 나오게 된 것이다.
20세기 미국의 윤리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정치란 불의한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 말했다. 정치는 이런 정신으로 해야 함을 21세기 신학은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반대입장에 있다. 한국만 해도 정치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아주 천박한 정치생각 때문에 정계에 활보하는 자들이 많다. 이는 세상물정 모르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자들로서 민주주의가 뭔지, 인간이 뭔지, 정치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동물적 감각으로 사는 자들이다. 기독교 교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의미와 뜻, 성경 내면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만 끌어 모아 자신만 잘 되면 만사 OK의 천박하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우선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공생애 시작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관련하여, “왜 권력을 누릴 기회가 있고, 경제자본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농부, 어부, 가난한 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시골 동네 갈릴리로 가셨는가” 부터 알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해야 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21세기 정치신학의 역할로 나타난다.
나아가, 21세기 정치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즉 성경으로 사물과 현상, 특히 정치나 경제현상을 평가하지 않고, 목회자든, 신학자든 정치이념을 성경보다 앞세워 그것으로 사물과 정치현상을 평가하는 것의 오류를 지적하며 시정토록하는 역할에 일정 부분 중점을 두고 있다.
“The price of apathy towards public affairs is to be ruled by evil men.”
“τὸ δὲ μὴ μετέχειν τῶν δημοσίων, οὐχ ὅπως ζημίαν ἀλλ᾽ ὅπως ζημιοῦνται ὑπὸ χείρονος.”
(공공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인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자들에게 국민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플라톤 Πλάτων Plátōn)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