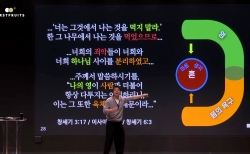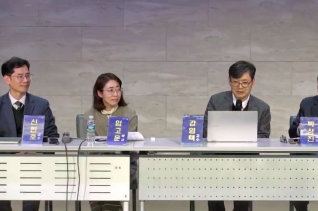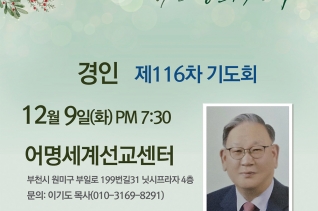단조롭고 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일상에서 ‘예배의 순간’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예배가 삶의 중심 키워드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상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루를 맞으며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등장하는 장면은 어떻게 그려질까? 이 ‘서신서’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자 정혜덕 작가는 이 책에서 각자 현재를 살고있는 삶의 풍경과 조건은 달랐지만,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여럿이 함께 드리는 예배, 형식과 순서가 있고 틀이 분명한 예배만이 아니라 전에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며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를 닦으면서, 커피를 내리고 물을 마시고 약을 먹으면서,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경험을 나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온갖 소음 때문에 자주 두통에 시달린다. 글을 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만, 생각보다 글은 잘 써지지 않고 한 문단을 다 쓰기도 전에 나달나달한 문장력과 빈곤한 어휘력을 직면하니 외려 슬퍼지곤 한다. 하지만 편지는 다르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는 세상 그 무엇에도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편지의 수신인만을 떠올린다. 그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를 내 앞으로 불러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말을 건네고 싶은 사람이 눈앞에 없어서 더 좋은, 역설적인 상황을 즐긴다. 아마도 편지 쓰기의 최고 장점은 (나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고 했다.
이어 “어느 날 저는 쉬지 않고 달렸다. 머리가 엔진이라면 두뇌가 온종일 5000RPM으로 도는 날, 조금도 숨을 고르지 못하고 어지럽게 돌아다녀야만 하는 날,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도 몸과 마음이 전혀 진정될 수 없는 날 말이다. 그런 날이었다. 식사를 마쳤는데도 제 마음속에 평화는 한 움큼도 없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흐르는 물소리. 부드러운 거품. 장갑을 뚫고 느껴지는 온기. 분명 온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길 정도로 중요한 일에 함몰되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심장이 1분에 100번씩 뛰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심장이 따듯해지며 온갖 어두운 망념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영혼이 위를 보며 한숨짓듯 속삭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설거지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거지나 쓰레기 버리기 같은 자잘한 일들 말고 본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묵직해진다. ‘대충 하고 치우련다’ 같은 자세로는 돈을 벌기 어렵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없다. 글을 잘 써서 ‘소명’에 충실하고 싶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예배는 저의 본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제게 몸과 마음이 무거워질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글이 안 풀릴 때인 것 같다. 저한테는 딱 제 수준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데, 슬금슬금 위대한 작가들의 산문을 곁눈질한다. 제가 쓸 수 없는 글을 쓰려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 몸도 마음도 묵직해진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