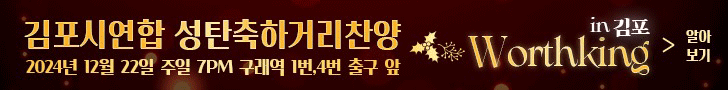영화 ‘동주’를 보았다. 토요일인데도 자리가 많이 비어있었다. 흑백에다가 다른 시대 느린 대화 때문이었을까. 참다못한 학생들이 자리를 뜨는 모습도 있었다. 비극적 시대 상황을 공감하기 어려웠던 탓도 있으리라.
영화를 보다가 ‘동주’와 ‘몽규’가 각기 ‘시’(詩)와 ‘총’(銃)으로 대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혹은 ‘개인’과 ‘국가’로도 대변될 수 있다. 동주는 ‘시적’인 사람이고 ‘개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 ‘몽규’는 ‘총’이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사실, 영화의 처음은 이 둘의 대조와 대립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 둘이, 즉, 시와 총이, 개인과 국가가 서로 교차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감옥에서 죽어가기 직전 마지막 심문 앞에서, 동주는 이 슬픈 시대에 시인이 되려 했던 개인적 꿈을 후회하고, 몽규는 ‘국가주의’라는 이름의 일본제국주의가 가졌던 열등감과 가증스런 위선을 폭로한다.
결국 두 친구는, 조선처럼 국가를 잃어버린 시대는 곧 개인을 잃어버린 시대이며, 일제처럼 개인을 잃어버린 국가 역시 국가를 잃게 된다는 역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둘 다를 회복하는 개인의 사적이고 시적(詩的)인 저항과, 집단적이고 무력적인 국가회복의 저항은 사실,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해를 보여준다.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주의’(nationalism)는 국가를 절대시하여 개인을 무참하게 희생시켜도 되는 허구적 이념이요 또한 우상(偶像)에 불과하다. 그것이 일제(日帝)와 나찌(Nazi)의 역사이다.
개인의 사적이고, 인간 보편의 아름다운 감성을 노래하는 시적인 추구도, 그것은 단지 ‘나약한 감상주의’가 아니다. 국가란 이런 ‘나약한 사적 감성’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인을 희생시키는 국가는, 국가주의라는 우상에 봉헌된 또 하나의 폭력적 제물일 뿐이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동주가 말한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다. 그것은 시인 정지용의 입에서 먼저 나왔지만, 동주의 고백에서 절정에 이른다. 부끄러움을 아는 힘이, 그로 하여금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 더 강력한 저항을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인간적 존엄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그것은 핵폭탄이나 사드보다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개인의 사적 감정이 아니다. 도리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 각 개인에게 충분히 납득될 때, 그런 개인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런’ 국가를 지키려 할 것이다. ‘국가주의’라는 우상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개인들의 사상, 생각과 감정까지 통제하려는 극소수 통치자들뿐이다. 일제가 우리 국가를 짓밟고 누렸던 특권처럼 말이다.
다시 한 번 ‘부끄러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것은 여린 감성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눈 감지 않은 마음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말살시키는 권력이나, 불의와 탐욕을 위해 자신을 천박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인간다운 결의(決意)이다.
국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개인들이 결국 국가를 지켜낸다.
영화 중간에 자리를 떠난 젊은이들이 아쉬웠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