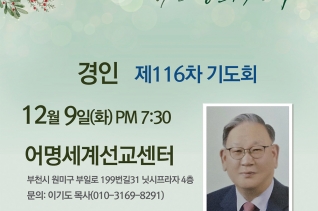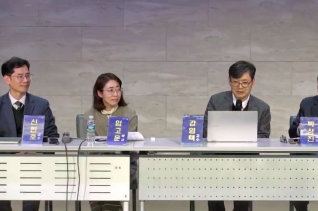사람은 상상하는 동물이다. 상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상상의 결국이 인류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유익을 끼치기도 한다.
최근 서점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벵하민 라바투트의 “매니악”이란 소설이 있다. ‘매니악’이란 말은 ‘미치광이’를 뜻한다. 이 소설이 다루는 주제는 과학의 진보가 이성의 광기일 수 있다는 가설을 내걸고 있다. 즉 과학적 발전이 숭고한 이념이나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몇몇 천재들의 호기심과 야심, 편집증의 결과일 수 있다는 논지이다.
과학자들이 지나친 지능을 주체하지 못해 인간과 윤리의 경계를 넘어서기도 한다는 말이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실존 하는 유명 과학자들이다. 이세돌과 알파고(AI) 이야기도 나온다.
작가는 세기적 천재 과학자로 불리는 폰 노이만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무거운 경고를 이렇게 전한다.
“진보를 치유할 방법은 없다”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매니악” 저자는 ‘이것이 현대인이 겪고 있는 근본적 공포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예고 없이 다가오는 천재지변 못지않은 인류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문명의 역설이다. 과학의 진보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통념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과학의 진보가 천재 과학자들의 이성의 광기에서 온 것이라면 무엇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진정성 있게 담은 과학자들의 양심선언이 있어야 한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한 핵무기 개발에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소신을 지켰다. 대량 살상을 가져올 핵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과학자의 양심을 선언한 것이다.
지금 과학계는 AI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어떠한 국제적인 규제도 없이 개발이 계속된다면 이는 인류 문명을 헤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뇌 병변 장애로 신체기능이 마비된 환자를 위해 머리에 칩을 삽입해 생각만으로 환자의 활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실험 결과를 내놓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활용 단계에 들어갈 때 따르는 우려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오용할 때 따르는 위험성 말이다. 인간을 자유자재로 조정하거나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래서 이차적으로는 양심의 소리를 선언하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 대표적인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이 모여 다보스 경제 포럼처럼 스스로 과학문명 발전의 미래를 위한 제약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문명의 발전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의 행복과 안전과 안락함을 주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과학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여 양심의 소리를 내고 스스로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마치 기후 규약을 만들어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는 전 세계적 국가들의 약속과 실천이 따르고 있듯이.
현대는 망상과 환상이 교차하는 시대이다. 자칫 망상으로 치닫는다면 희망이 없다. 멸망으로 가속이 붙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 문명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건강한 환상(vision)을 품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망상은 종말적 세계를, 환상은 희망적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제 망상과 환상 사이에서 선택은 인류의 몫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