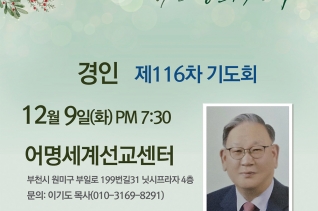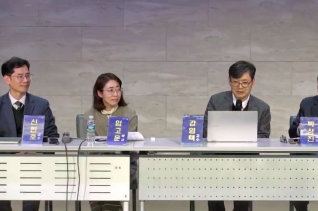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저자인 김혜령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의 동행기. 이 동행에서 “아버지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해석학’이다. “‘어떻게 삶을 해석해 낼 수 있느냐’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돌봄의 방식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질문한다. ‘아버지는 왜 정처 없이 밖을 배회하는가’ ‘대소변 실금에 대한 혐오는 정당한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지배 질서는 무엇인가.’ 이는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철학·신학·사회학을 경유해 ‘인간’을 다시 질문하는 “생존의 해석학”적 작업이다. 지난한 일상에 두 발을 딛고 철학적 사유를 펼치는 몸짓이다. 그 치열하고도 유쾌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인지와 신체 능력이 서너 살 수준으로 퇴행한 아버지는 깨어 있는 동안 남들 보기에 한없이 가엽고 지루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나는 ‘오로지 시간을 견뎌 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겸허한 삶의 단계가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진리를 아버지가 내게 온몸으로 가르쳐 주고 있음을 깨닫는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성취한 빛나는 것들보다, 나는 병든 아버지가 죽기까지 버텨내며 증거하는 삶의 진리를 더 오래 기억하며 내 삶을 버텨 내는 힘을 얻을 것이다”며 “신학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다. 삶의 해석학으로서의 신학은, 세례를 받고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며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신학의 언어 핵심에는 경쟁이 최우선의 논리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아등바등 생존하기 위해 타자의 취약함을 쉽게 외면하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정당한 것인지 따져 묻는 ‘보편적 질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이 글은 치매 환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호소문이 아니다. 이 글은 치매 환자가 된 아버지와 하루하루 더불어 살기 위해 애쓰는 내 마음에서 쉬지 않고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삶 그 자체에 대한 경외감으로 아버지와 가족을 다시 이해하고자 하는 생존의 해석학이다. 좌절과 희망이 무한대의 변증법처럼 교차하는 삶의 순간순간, 이 해석학을 통해 나는 아버지의 질병을 이해하고 나의 부족함을 견뎌 보고자 한다”며 “이제껏 우리는 치매 환자의 사회적 삶에 내려진 사망 선고에 너무 쉽게 순응하며, 치매 환자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로 취급해 왔다. 그렇게 그를 수치스러워하며 집안의 사적 존재로 숨겨 왔다. 그러나 인간은 죽는 날까지 사회 밖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인간은 단 한 순간도 ‘사회적 존재’가 아닌 적이 없다. 동시에, 인간이 하나의 사회 안에만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일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드는 일,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일은 어느 사람도 피할 수 없다. 폴 리쾨르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죽을 때까지 살아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서로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진심에 달려 있다. 변화 가능성과 취약성, 그리고 상호 관계성에서 다시 쓰는 현대 신학의 존재론과 신론 위에서 치매 환자의 존재는 더 이상 저주받거나 열등한 존재로 해석될 수 없다. 그는 ‘죽음만을 남겨 둔 절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존재’로서 날마다 취약하게 변해 가는 그의 몸과 정신이 그에게는 의존 속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고, 타인에게는 돌봄을 제공하며 의존할 수 있는 축복을 준다. 그렇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도 나의 손을 잡고 무섭지 않았지만, 나도 아버지의 손을 잡아 세상에 우쭐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