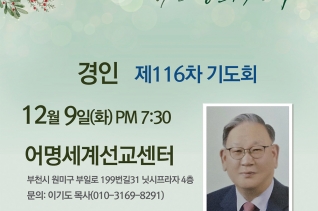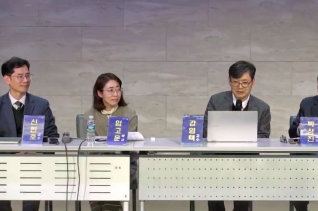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팀 켈러의 현대 과학의 진화에 대한 정통 개신교인들의 네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첫 번째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두 번째 어려움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팀 켈러는 진화론에 대해 정통 개신교인들이 생물학과 철학을 혼동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 주장이 정당할지 살펴보자.
이 주장을 논박하기 전에 우리는 팀 켈러의 질문이 정당한가부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냐하면 생물학과 철학을 혼동하는 사람은 정통 개신교인들이 아니라, 팀 켈러 자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진화론은 아직 ‘론’(ism)에 불과하다(물론 영어에서 진화론은 ism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 진화론은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칙으로 불리지 않는다. 진화론은 철학적 주장을 과학과 생물학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란 반틸의 주장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의 교차”이다.1)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 과학지식이다. 그리고 이런 과학지식을 철학으로 시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화론이다.
진화론의 철학적 인식은 이미 B.C. 6세기쯤 활동했던, 자연주의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가 “사람은 물고기와 유사한 상태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한 주장에도 나타난다. 이런 주장은 진화 과정에 있는 어떤 생물을 관찰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자신의 철학을 기반으로 현상을 추론한 해석이었다. 또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이론도 진화론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줬다. 모든 것은 끝임 없는 대립과 갈등에 의해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 레싱은 그의 역사 철학에서 “현재의 세계가 과거의 세계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하여, 다윈의 종의 기원에 영향을 끼쳤고, 이는 오늘날 생물학의 주류 이론이 됐다.2) 이 시도는 후에 다윈의 적극 추종자였던 토마스 헉슬리에 의해 ‘우생학’으로 발전했다. 우생학은 인류가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라고 전제하고, 열등한 종은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진화를 인위적으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후에 히틀러에게 영향을 줌으로 인류 역사에 충격을 주는 끔찍한 학살(genocide)의 철학적 근거가 되었다. 철학과 생물학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생물학과 철학을 혼란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들이 팀 켈러의 유신진화론에서 혼란을 갖게 된 부분은 그 다음이다. 기본적으로 팀 켈러는 철학적 진화론과 생물학적 진화론을 분리해서 이해하도록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진화생물학적 과정(Evolutionary Biological Processes/EBP)과 인간의 모든 측면을 진화로 설명하려는 대이론(the Grand Theory of Evolution/GTE)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설득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생물학과 철학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다. 따라서 그는 ‘진화생물학적 과정’은 과학이므로 기독교인이 수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없다고 한다. 진화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 이론’일 뿐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대 이론은 세계관, 다시 말해서 철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팀 켈러가 어떻게 진화론을 생물학과 철학으로 분리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주장은 과학이나 생물학을 철학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가 소위 과학이나 생물학이라 부르는 것은 순수한 관찰의 결과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種)과 류(類)를 나누는 생물학적 분류법조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았다. 모든 생물의 보편자를 찾는 철학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나온 분류법이다. 팀 켈러는 독자들로 하여금 진화생물학적 과정이 아무런 철학적 영향 없이 순수하게 관찰과 연구만으로 입증된 결과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마치 진화생물학적 과정을 ‘공리’(입증/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진리)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물학적 과정으로 묘사된 진화론은 마치 수학으로 표현된 천동설과 다르지 않다. ‘진화생물학적 과정’이라는 이론은 그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대 이론’의 영역 가운데 포함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다. 대 이론과 진화생물학적 과정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다. 대 이론이 큰 동심원이라면, 진화생물학적 과정 이론은 그 안에 포함된 작은 동심원이다. 팀 켈러가 기독교인들은 대 이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논리 속에는 진화생물학적 과정도 당연히 포함되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대 이론‘(GTE)은 수용할 수 없지만, ‘진화생물학적 과정’(EBP)은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진화생물학적 과정을 수용하려면, 분명히 대 이론을 수용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사실에 도달하기 전에는 분명히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전제 돼야 한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에 도달하기 위해 “생각하는 나”에 대한 믿음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진화생물학적 과정”(EBP)을 수용하려면 분명히 유물론과, 더 나아가 이신론 철학 관점을 수용해야만 한다. 신이 없다고 믿든지, 아니면 창조의 신은 창조만 하실 뿐, 세상 역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다고 믿어야 한다.
팀 켈러의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연’에 대한 인식이다. 물론 팀 켈러는 자신의 아티클에 ‘우연’이라는 표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화생물학’을 언급할 때, ‘우연’은 항상 뒤따라오는 개념이다. 우연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자연법칙’이라는 표현으로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자연법칙’은 우연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도록 창안된 용어이기도 하다. 오늘날 ‘자연법칙’은 창조의 근원처럼 이해되고 있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부터 그 무엇이 존재하는 상태로 바뀌었다”고 하고, “자연법칙이야말로 우주 탄생과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 무(無)에서 유(有)가 생겨났고, 무에서 유의 근거는 자연법칙으로 논증된다. 이렇게 하여 자연법칙은 은연중에 무 이전의 존재로 여겨진다. 자연법칙은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 한 것이다. 어쩌면 팀 켈러의 주장은 스티븐 호킹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천문학의 자리에 생물학을 올려놓은 정도일 뿐이다. 팀 켈러가 ‘진화생물학적 과정’(EBP)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 논리는 “자연법칙”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된다.
다시 ‘진화생물학적 과정’이라는 표현을 들여다보자. 여기서 사용된 ‘진화’라는 용어는 섭리적 의미(보존과 통치)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가 새로운 류(類)의 존재 가 있게 만든 근거라는 차원에서 보면 ‘창조’의 의미를 가진다. 진화를 마치 창조법칙처럼 이해한다면 이 용어는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점은 인간 존재 목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진화를 인간 존재와 연결시키면,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예배)을 위해 창조된 존재로 볼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화는 우연의 결과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여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진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만든다. ‘우연’은 ‘필연’을 동반할 수 없다. 필연을 동반할 수 없다면 인간이란 존재에게 목적성을 찾을 수 없다. 만일 진화를 ‘적자생존’(이기적 유전자)으로 설명한다면 더 심각하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선한 일을 위해(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된 필연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논리다.
종합적으로 볼 때, 팀 켈러의 진화론에 대한 논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적 신앙으로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무신론이나, ‘이신론’(deism)으로 인도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시도는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교회를 타락시키고 이단이 창궐하게 만든 원흉이었다. 우리가 만일 진리를 전제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진화론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의견’을 사용하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진리에 대한 확신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당대 최고 지성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혐오했다. 그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을 자랑스러워했고(고전 1:17),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라고 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은 이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겐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 또 이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겐 걸림돌이 됐다. 물론 복음은 분명히 설득의 영역으로 가득하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전했다. 교회사의 영적 거인들, 위대한 설교자들도 수사학과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믿어야 할 영역’과 ‘납득의 영역’을 혼동하지 않았다. 믿어야 할 영역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고, 이해시켜야 할 영역에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다. 애석하게도 팀 켈러는 믿어야 할 영역과 납득의 영역에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아쉽지만 팀 켈러의 유신진화론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이 글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졸필을 읽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필자의 역량이 너무 부족함을 통감하며, 나머지의 영역은 필자보다 더 탁월한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많으시기에 그분들께 맡기고 싶다. 모쪼록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진리만 왕 노릇 하길 소망한다.
1) 코넬리우스 반틸, 「변증학」, 신국원 옮김, (개혁주의신학사, 2017) p.236.
2) 에타 린네만, 「성경비평학은 과학인가 조작인가」, 송 다니엘 역, (부흥과개혁사, 2010) p.86-87.
3) 존 레녹스, 「빅뱅인가 창조인가」, 원수영 옮김, (프리윌,2013) p.55.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