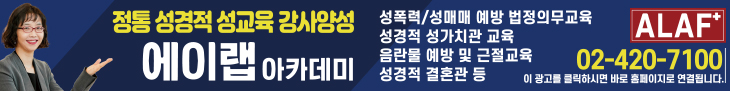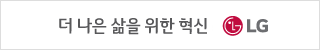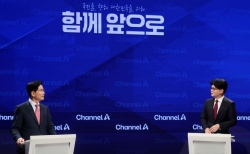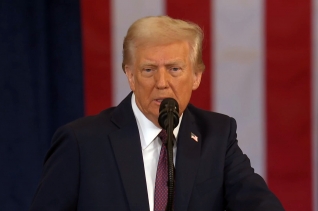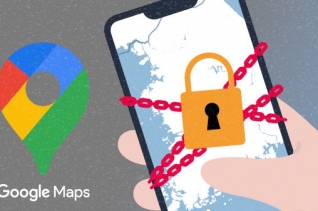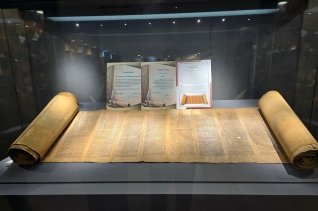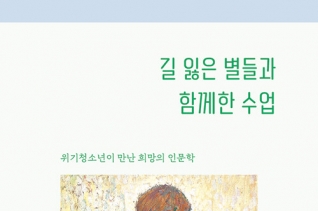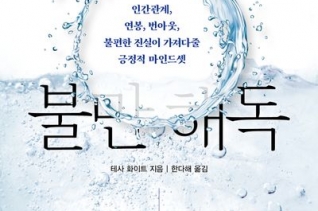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문턱이 높은 50대 이상 인구가 자영업에 몰리고 있으나,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열악한 소득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년 이상 임금근로를 한 뒤 2022년 기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중 58.8%가 50세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9%, 60세 이상은 29.9%였다.
이들 고령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인 53.8%는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업종에 생계형으로 뛰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들 업종은 부가가치가 낮고 경쟁이 심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또한 전체 고령 자영업자의 83.4%가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비율인 75.6%보다도 높은 수치로, 고령층 자영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령 자영업자의 48.8%가 월 최저임금인 209만6270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를 접고 자영업에 나섰음에도 소득은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창업 전 임금근로 경력에 따른 소득 차이도 확인됐다. 임금근로 기간이 1~3년인 경우 월평균 자영업 소득은 338만7000원, 4~6년은 347만3000원으로 나타났지만, 7~12년은 200만 원 안팎으로 떨어졌고, 13년 이상 경력자는 다시 259만~333만 원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정보원은 경력이 짧거나 매우 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 중 최고 소득자조차 최근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인 379만6000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창업 전에 관련 산업에서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평균 순소득은 144만30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쳤다.
생계형 자영업자와 비생계형 자영업자 간에도 격차가 뚜렷했다. 생계형의 평균 순소득은 225만2000원이었고, 비생계형은 343만2000원으로 약 120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고용 여부에 따라서는 격차가 더 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월 227만6000원을 벌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41만9000원의 순소득을 올려 2.4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여성 고령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192만1000원으로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67.5%에 달했다. 반면 남성은 312만9000원으로 여성보다 120만 원 이상 많았다.
고용정보원은 “자영업은 임금근로의 대안이 되기 어렵고, 임금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성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령자가 조기 퇴직 이후 자영업에 내몰리지 않도록 재취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