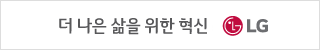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이다. 동족상잔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이 된 그 날의 포성은 멈추었으나 그렇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니다. 전쟁이 잠시 중단됐을 뿐 언제든 다시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다. 교계는 6.25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자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나 됐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선 아직도 전쟁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다. 북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저지른 침략전쟁이란 게 역사적으로 실증됐음에도 미국을 남북분단의 원흉으로 지목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6.25 전쟁의 책임 소재를 굳이 따져야 한다면 그에 앞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8.15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합의한 후 1945년 2월 열린 얄타회담에서 미국·영국·소련 등 3개국 정상들이 한반도를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에 맡겨 일정 기간 신탁통치를 거친 후 독립시키기로 합의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돌이켜보면 당시 일본군과 마지막 일전을 치르던 미국이 소련을 끌어들인 게 가장 뼈아프다. 결과적으로 소련이 한반도 북쪽을 장악하도록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북위 38˚선을 미군과 소련군의 경계선으로 정해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한 게 다행일 정도다.
그런데 이것이 남북분단의 서막이었던 건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미국은 북위 38˚선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한 반면, 소련은 북위 38˚선을 정치적인 경계선으로 삼아 북쪽을 소련 연방 관할에 귀속시키려는 야심을 품은 게 결정적 요인이다.
1947년 9월에 한반도 문제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UN으로 이관되면서 UN은 제2차 총회에서 통일 한국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5월 3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문제는 소련군의 거부로 UN 선거감시단이 북한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UN 결의로 남한에서만 선거가 치러지게 된 점이다. 남한은 1948년 5월 31일 국회의원 선거 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련의 수중에 있던 북한에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지 못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해 무장공비를 남파하고 남한 각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빨치산)이 납치 테러 폭동을 일삼아 극심한 사회 혼란과 치안 불안을 조성했다. 1948년 제주 4·3사태와 1948년 10월 20일 여순반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공산 무장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 시도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야욕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1950년 주일 새벽 미명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감행한 북한 김일성의 목표는 한반도를 공산화해 제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이었다.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남한 사회의 혼란이라는 취약성을 노려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게 그 증거다. 이는 소련이 ‘페테스트로이카’ 즉 개혁 개방정책으로 연방제가 무너진 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수교를 맺을 당시 공개된 소련의 비밀문서에 상세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한반도를 초토화하고 남북분단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다. 그런 러시아가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고 북한의 도발 야욕을 제어·통제하지는 못할망정 다시 북한과 다시 짝짜꿍이 되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획책하고 있으니 참으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나 맺은 조약의 핵심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양국 군대가 개입한다”는 거다. 유사시 지체없이 군사 지원을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고 어떤 불장난을 벌일지 전 세계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핵을 가진 독재자들에 둘러싸여 미국의 핵우산만을 바라봐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6.25 전쟁이 남긴 상흔은 크고 깊다. 3년여 교전으로 우리는 약 5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전사했다. 이는 당시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얼마나 큰 희생이 초래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도 우리보다 곱절 이상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전쟁을 일으킨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하지만, 그 누구도 전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건 6.25 전쟁이 남긴 상처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계는 6.25 74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메시지와 성명에서 한결같이 한반도에 자유·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사회에 드리운 분열과 반목의 그림자가 74년 전과 너무나 흡사해 걱정이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한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 화해와 공존,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각기 맡은 자리에서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다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