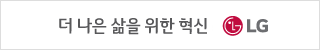육군 부사관으로 복무중 성 전환 수술을 했다가 전역 처분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국방부가 순직으로 인정하고 보훈부가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교계 및 반동성애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원점에서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동연, 진평연, 수기총 등 기독교계 반동성애 연합단체들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성 전환 수술 후 군 당국이 내린 전역 결정에 반발해 전역 취소 처분 행정 소송 중 자살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 및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변 전 하사는 2017년 3월 1일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복무 중 2019년 11월 29일 태국에 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 후 2020년 1월 9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1월 22일 전역이 최종 의결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자신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했으니 여군으로 복무케 해달라며 2020년 2월 10일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11일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고 변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대전지법행정2부가 2021년 10월 7일에 전역처분취소 판결을 내리자 육군은 항소를 포기했다. 그 이듬해 12월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했으나 올해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순직을 인정해 논란을 자초했다.
고 변 하사의 자살사건이 군 당국에 의해 ‘일반 사망’에서 ‘순직’으로 바뀌게 된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 우선 변 전 하사가 전사자들이 묻혀있는 국립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고 변 하사에게 적용된 ‘순직’에 대해 군법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 제54조 ‘보상’에는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 규정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도록 돼있다.
군인사법 제54조의 2에서 ‘순직’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이다.
반동성애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군인사법 상 3가지 순직의 유형 중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여군 복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 자살한 변희수 씨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고 변 전 하사를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가 ‘순직’으로 바꾼 건 법원이 그의 전역처분을 추소하자 육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연관이 있다. 군 당국이 그가 전역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정서적 혼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에 대한 법적 규정을 바꾸어 규정 어디에도 없는 ‘순직’으로 처리하고 전사자들과 나란히 현충원에 안정하는 건 명예에 따른 예우를 기본으로 하는 보훈 규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방위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사법은 엄격한 규정에 준해 무엇보다 공정하게 처리되는 게 마땅하다. 만에 하나 이런 엄격한 규정이 법이 아닌 인정으로 흐른다면 군 기강의 전반적인 해이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변 전 하사에 대한 순직처리와 현충원 안장 허가 과정은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다. 군 복무 중 사병의 작은 일탈도 용납이 안 되는 게 군대라는 조직사회다. 하물며 일반 사병도 아니고 부사관 신분으로 복무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외과적인 성 전환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군 기강에 엄청난 해를 가져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여군으로 복무케 해달라고 떼를 쓰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 법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사건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에선 그가 복무했던 군대라는 조직에 ‘성 정체성’을 무기로 온 몸으로 저항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응당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역 조치된 일반인을 법원이 군인으로 판결하고 이를 군 당국이 다시 현역 군인이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것과 똑같이 ‘순직’으로 처리한 것은 실제 순직군인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구나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친 전사자와 순직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에 안장하기로 한 건 전체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전체의 서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지 올해 74주년을 맞았다. 북한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욕에서 비롯된 침략전쟁에 엄청난 젊은 군인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 전사했다. 그런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온 국민이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에 자살한 성 소수자를 나란히 안장하는 건 현충원을 만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앞으로 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한 몸 바쳐 희생하려 들겠는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