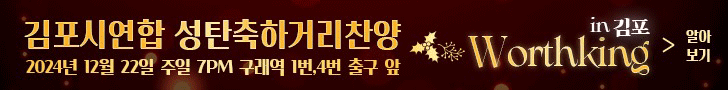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한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힘들어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을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교인들만큼 코로나로 인한 우울을 크게 경험하는 집단도 없다고 본다. 어쩌다 보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퍼트리는 원흉처럼 낙인찍혀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강제하였고 교인들의 모임을 지양하라고 한다. 꼭 얼굴을 마주 보고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는 말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코로나19가 극성을 피울 때 대부분 교회와 교인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몇몇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전국의 기독교 교인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교인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때로는 종교탄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신앙적인 억눌림 속에서, 많은 기독교 교인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 필자는 코로나19 중에도 왜 교인들은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코로나19가 전염된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상황을 말하고 싶다.
첫째, 교회를 찾아가는 것만으로 기독교 교인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준다. 교회에서는 예배뿐 아니라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도 때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다. 교회의 건물은 기독교 교인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려도 자꾸 교회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교회는 기독교 교인들의 영혼의 안식처이다. 그런 기독교 교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런 시국에 굳이 교회에 가냐고 비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교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모르고 교회를 방문하여 나의 동선 안에 교회가 포함되었다고 공개되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또 한 번 시험 거리가 될까 봐 두려워서이다.
둘째, 기독교 교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 물론 기독교 교인들이 고대사회처럼 직접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교인들은 서로를 우리 교회 식구라고 부른다. 식구는 다른 말로 가족이다. 매주 얼굴을 보던 가족들이 언제 얼굴을 볼 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가 없다. 가장 친한 열 사람을 꼽으라면 그중 7~8명이 같은 교회 교인이다. 가까운 지인들이 모두 교인이다 보니 직장과 가족을 제외하면 교인이 아닌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교인이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교인이 코로나19에 걸리면 교회 모임 때문에 코로나19가 번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교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니 마음의 상처가 커지는 것이다.
셋째, 요즈음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환경의 차이가 교육격차를 키운다고 이면을 이루는 전자기기 활용의 제약도 한몫한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전자기기를 활용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갑갑함을 토로하신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이 예배와 모임에 대해 갈급함이 더 심화되지만 해소할 수 없으니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다고들 말을 한다. 언제까지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음이 더 힘들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 지금의 상황은 기독교 교인들이 코로나19를 이기고 나면 예배와 교회에 대해 소중함을 깨달은 귀한 시간으로 기억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울을 떨쳐 버리고 사회에 만연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어떻게 바꾸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할 것인지 고심해봐야 할 때이다.
노은영 작가(사회복지학 석사, 청소년 코칭전문가)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