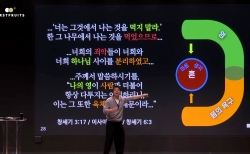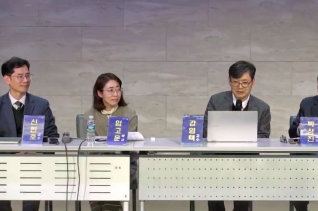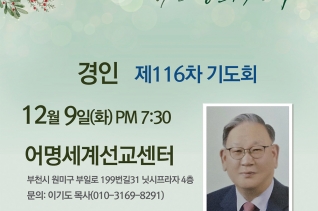[기독일보]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Hot)한 신학자 중 한명인 케서린 켈러가 방한, 감신대(중강당; 23일, 월), 장신대(새문안홀; 24일, 화), 그리고 연세대(신과대학 B114; 26일, 목) 강연과 컨퍼런스를 그리고 미국의 탈자적 자연주의(ecstatic naturalism)의 거장인 로버트 코링턴이 서강대(정하상관; 24일 화, 5시), 연세대(신과대학 B114; 26일 목, 4시)에 마찬가지로 강연과 컨퍼런스를 갖는다.
이 두 석학의 방한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로 암울한 종말의 레퍼토리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많은 한인 학생들을 가르쳤던 두 신학자와 철학자는 밤이 깊어도 새벽이 온다는, 겨울은 모든 계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각자의 주제를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케서린 켈러는 과정-페미니스트 신학자로 출발하여, 중세 신비주의와 현대 물리학 그리고 신-물질주의(new materialism) 혹은 사변적 실재주의등을 섭렵하며, 화이트헤드와 들뢰즈 그리고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을 신학적으로 소화하면서, 미국 신학계의 사유를 선도적으로 심화시켜 가고 있다.
특별히 루이스 이리가라이의 페미니즘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등장한 주디스 버틀러의 포스트페미니즘(post-feminism) 담론을 이제는 ‘트랜스-페미니즘’ 담론으로 지향하자고 제안하면서, 세상의 인간-존재를 남/녀의 이분법이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중층적인 관계성의 존재론으로 확장 연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아닌 존재들 즉 자연과 사물 및 우주적 존재들을 신학적으로 사유하고 성찰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 물리학의 아인쉬타인-포돌스키 실험을 인용하면서 모든 존재들이 근원적으로 입자 이하의 차원에서 관계적으로 엮여 있으며, 이는 곧 우리의 언어가 언제나 그 복잡하고 중층적인 관계의 실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언어의 무능력에 대한 인식은 곧 중세 신비주의 사상가 특별히 니콜라스 쿠자의 신학을 다시금 조명하는 작업에 이르게 했으며, 르네상스 직전의 이 신학자가 현대 물리학의 통찰들을 어떻게 언어 너머로 예견했는지를 조망하면서, 신학은 언제나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시대에 적절하게 전달해 주는 것임을 강조한다.
모두가 돈과 권력이면 세상을 소유한다는 착각 속에 소비 자본주의 문화를 허우적 대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다른 학문의 언어가 아닌 신학이 더욱 더 성찰되어야 하는지를 궁리하고 있다. 차이와 다양성의 시대를 넘어 다수성(multiplicity)의 시대 한 복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21세기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신학은 인간이 디지털 기계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온전히 가리킬 수 있다고 그녀는 믿는다.
이번 방한 중 감신대와 장신대에서는 “Entangled Hopes: Transfeminist Theological Im/possibility”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이분법을 넘어 존재의 관계적 복잡성과 중층성을 유념하면서도 현실의 여전한 성적 불균형과 차별을 성찰하는 글을 발표하는데, 결국 희망은 우리의 성화(sanctification)적 노력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im/possibility’라는 단어에 담는다.
연세대에서는 최근 불거지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불안해 지는 국제정세 앞에서 또 다시 종말(apocalypse)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권력작용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오늘의 소중함을 성찰하는 정치신학을 제시한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은 자연과 우주와 생물과 생태와 비인간 존재들과 더불어 복잡하게 관계하고 있는 상황 즉 entanglement에 대한 정치신학적 조망할 예정이다.
로버트 코링턴은 미국 뉴잉글랜드 초월주의의 흐름을 잇는 미국 자연주의 전통의 학자로서 자신의 철학을 탈자적 자연주의(ecstatic naturalism)로 규정한다. 특별히 미국의 천재적 기호학자 찰스 퍼어스의 기호학적 사유를 종교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전용하면서, 자연을 자연화하는 자연(nature naturing)과 자연화된 자연(nature natured)으로 구별한다. 이는 스피노자의 자연 개념을 빌려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개념에 머물지 않고, 자연의 이 이원화 ‘사이’(between)에서 코라적 부정성을 포착하여, 살아있는 존재의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성찰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특별히 20대 후반에 발병한 조울증을 안고 살아오면서, 매일 매일을 그 증상과 투쟁해야 하는 힘겨운 시간 속에서 희망의 철학을 해석학적으로 전개한다.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마치 절대적 존재 혹은 자연 혹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삶과 같은 느낌일 것이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why only me?)라는 환상 속에 머물려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생물 종들에게는 기존과는 다른 즉 정상과는 다른 존재들, 예를 들어 천재(genius)와 같은 존재들이 발생한다. 그들은 전체 종 혹은 인류를 위한 훌륭한 기여가 되든지 혹은 절망과 좌절로 사라지든지 한다. 그 비극적 천재들의 삶을 인간과 자연을 위한 희망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해석자들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진리는 우리와 같은 임시적 기호사용자에게 언뜻 스쳐지나가며 영감과 통찰을 제공할 뿐이다. 그런 진리와의 만남 사건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실현시키는 것은 인간 주체들이 모인 해석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이다. 우리의 해석적 노력은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다.
수많은 실험과 탐구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앞으로 나아가듯이, 생명의 과정을 성찰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학적 혹은 철학적 노력들은 절대적 진리에 곧장 이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자들의 공동체와 연대하여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이 희망은 사실적 근거를 통해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과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링턴의 철학은 성스러운 초월적 영역이 이 땅의 삶 속에 간헐적으로 출현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우리의 삶에 그 성스러움이 내려와 삶의 소중함과 신비함을 지켜준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연세대에서 코링턴은 “Violence, Creativity, and the Unconscious of Nature”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데, 인간 삶의 세계에 편만한 폭력이 해석과 성찰이 결여된 정치적 패거리의 삶의 구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러나 자신의 비극적 삶을 희망의 해방하는 힘으로 전환시킬 동기를 소수의 비극적 천재들은 모색하며, 이 소수의 힘은 바로 자연의 무의식이 생명의 과정을 보듬는 과정의 일부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서강대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탈자적 자연주의를 실용주의와 심층 심리학의 만남으로 설명하면서, 퍼어스와 제임스 그리고 융과 랑크의 철학과 심리학이 자연의 무의식을 조망하는 자신의 철학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를 성찰할 예정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