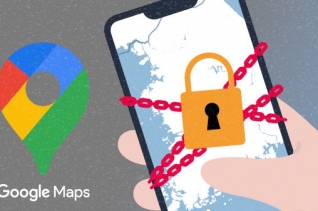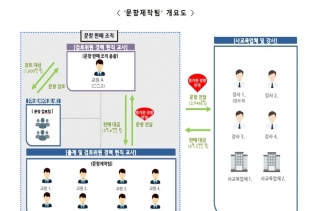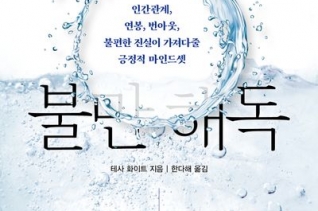KT의 '배짱'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4년 전 KT와 기업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를 3년 약정으로 맺었던 전주 A병원.
A병원은 KT로부터 '약정 기간 만료'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께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한 뒤 100만원이 넘는 반환금 폭탄을 맞았다. KT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약정 기간이 끝났다고 말한) 통화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A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병원은 KT 직원과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약정 기간 만료' 사실을 올해만 적어도 세 번이나 확인했다. 1월과 2월 상담원과 두 차례 통화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2월에 KT 직원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약정 기간이 끝나 (번호 이동을 해도)별도 위약금은 없다"고 확인받았다.
하지만 3월 말 타 통신사로 전환한 뒤, KT로부터 102만1433원을 내라는 우편물이 날아왔다. 청구 명목은 '인터넷 결합 할인 반환금'이었다.
A병원 관계자는 "1월에는 동료 직원이, 2월에는 내가 (KT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서 약정 기간이 만료돼 위약금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통화 기록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KT 자신들이 잘못 안내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주 KT 고객센터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KT 측은 이에 대해 "2010년 3월 (계약)당시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가 분리돼 있었고, 2012년 10월 인터넷과 전화를 '결합 상품'으로 묶어 약정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결합 상품으로 묶으면서 '약정이 바뀐 내용을 고지했거나 통화내역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발뺌했다.
KT의 횡포는 이뿐만 아니다.
앞서 2010년 11월, 3년 약정으로 업무용 KT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한 B씨는 직원의 무성의한 태도에 수십만원을 피해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입 당시 "약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 처리된다"는 KT 직원의 말만 믿고 해지된 줄 알았는데 최근 통장을 확인해보니 매달 3만원 가량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KT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직원이 얘기했더라도 해지신청은 가입자가 직접해야 한다"며 거절당했다.
지난달 24일 '20% 요금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 KT와 12개월 약정을 맺은 C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직원 실수로 약정 기간이 24개월로 둔갑했지만, 원상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KT 때문에 애를 먹었다.
KT 측은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자필로 서명한 각서까지 보내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산시스템 오류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룬 것이다.
C씨는 "KT가 실수를 인정해놓고 온갖 핑계로 약속을 미뤘다"며 "각서를 두 번이나 쓰고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결국, 지난 19일 뉴시스가 취재에 나서자 원래 계약대로 복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했다.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 관련 분쟁'이 29.4%(50건), 약정 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 17.1%(29건) 등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밖에 ▲부당요금 청구 14.1%(24건) ▲서비스 품질 불만 11.8%(20건) ▲약정 불이행 7.7%(1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 간 과다한 고객 유치경쟁으로 명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다"며 "휴대전화·TV·전화를 묶는 결합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약정 기간 등 계약 내용도 복잡해져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환급·계약해지·배상 등 피해 구제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