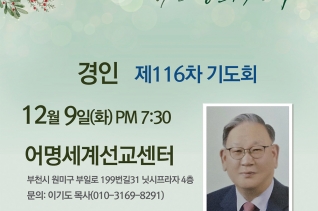Ⅵ. 국가와 신앙
“정부는 실로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 모든 국가들(민족들)에서. 모든 군주들과 권력자들 개인에게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즉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원하고 알든, 원하지도 감사하지도 안든, 하나님께 의존적이며, 통치권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국가와 정부와 종교의 관계 대한 카이퍼의 사상을 대변한다. 비록 카이퍼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국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정부는 네덜라드 정부인 기독교 국가의 정부를 의미한다. 기독교 국가와 정부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반혁명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liberalisten)을 갈라놓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카이퍼에 따르면 “무신론 국가는 없다.”(Geen ‘état athée.’)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국가로서 신정주(theocratie) 정치체재로는 두 종류로 대별 되는데, 하나는 서로마제국과 로마가톨릭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동로마제국과 러시아와 같은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e)다. 카이퍼는 교회가 국가나 정부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교회로서의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고, 국가나 정부가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방정교회 국가들을 비판한다.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는 국가생활의 좁은 형태들에 끼워 맞출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카이퍼는 국가교회(Staatskerk) 형태를 반대한다. 따라서 그가 강조하는 기독교 국가(Christelijke Staat)는 기존의 국가교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와 교회, 정부와 기독교는 혼합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와 교회는 상호 협력 관계지만 뿌리와 성격이 각기 다르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자연적 삶”(het natuurlijk leven)에 뿌리를 내리고 “자연적 신지식”(een natuurlijke gedskennis)만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초자연적 나라”(een bovennatuurlijk Rijk)이고 “초자연적 신지식”(de bovennatuurlijke godskennis)이 빛나는 곳이다.
카이퍼는 세 가지 형태의 국가 체재를 소개한다. 첫째는 “자유주의자들의 하나님 없는 국가”(de God-looze Staat der liberalisten)이고, 둘째는 “로마 가톨릭과 일관성 없는 개신교의 신정주의”(De theocratie der Roomschen en inconsequente Protestanten)이며, 셋째는 “정치적이면서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개혁주의 국민 또는 청교도 국민들의 국가”(de politieke en toch den levenden God belijdende Staat der Gereformeerde of Puriteinsche volkeren)다. 마지막 세 번째를 대표하는 국가로는 정부가 기도의 날들을 선포하고 주일을 존중면서도 교회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이유에서 미국이다.
카이퍼에 따르면 정부는 “영혼구원”(de zaliging der ziele)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niet-bemoeiïng) 원칙을 의미하는데, 카이퍼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경우 정부가 종교를 타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혁명파와 달리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타락한다는 이유로 이 원칙을 고수한다. 카이퍼가 주장하는 개혁주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는 “정치적 삶과 국민의 삶이 상호 연결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신앙고백 제36조의 내용처럼 기독교 국가로서 정부의 이단처벌 문제에 대해 카이퍼는 반대하면서 신앙의 “무차별주의”(indifferentisme)를 주장한다.
카이퍼는 네덜란드신앙고백 제36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이단을 처벌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대해 “정치적 우리 조상들의 불충분한 국가이론”(de gebrekkige staatstheorieonzer politieke vaderen), “잘못된 이론”(verkeerde theorie)이라고 일축하면서 다른 원리를 제시한다: “국가로부터는 신앙의 발전을 위한 자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신앙의 자유, 즉 종교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양심의 자유”(consciëntievrijheid)와 함께 옹호되어 왔다. 카이퍼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원칙을 다음과 같이 한 마디로 천명한다. “정부는 계시된 종교의 영역 밖에 있다.” 기독교 정부는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카이퍼는 기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 정부의 의무를 4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 “복음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사역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복음과 대립하는 어떤 것도 정부로부터 도입되거나 보호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카이퍼는 복음과 대립적인 것으로 “인본적인 복음”(een Humaniteits-Evangelie)을 언급한다. 셋째, “종교 영역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기독교 종파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와 타종교인에게도 모두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한다. 넷째, “양심은 결코 강요되지 말아야 한다.”
Ⅶ. 영역주권과 국가
카이퍼에게 매우 중요한 “양심의 자유”(de vrijheid van consciëntie)는 그의 “영역주권”(een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고유 영역의 주권)이라는 개념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물론 영역주권을 가능하게 한 분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각 영역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자신의 주권을 알맞게 나누어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분배 받은 각 영역은 그 주권이 침해 받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한다. 각 영역은 각기 자신의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하나의 주권으로부터 위임된 것일 뿐이다.
“양심은 자기 영역에서 주권적이다.”(de consciëntie souverein in eigen kring) 그러므로 “양심에는 국가권력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국가권력의 경계선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정부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만큼만 권력을 가질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한계가 없는 유일한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력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 불리신다.” 국가권력은 결코 양심의 영역을 넘어설 수도 없고 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카이퍼는 양심까지도 억압할 만큼 정부가 무제한의 권력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의 신격화”(staatsaptheose; staatsvergoding)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카이퍼는 권력의 분화 즉 주권의 분화를 주장한다.
실제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인생 가운데 부르신 기관”에 대해 말하는 순간, 권력 분배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모든 종류의 질서에 따라 기관들을 부르셨고 각 [기관]에 알맞은 권력을 제공하셨다. 그분은 주셔야할 만큼만 권력을 분배하셨다. 그분은 단독 기관에 자신의 모든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기관마다 그 특성과 소명에 적합한 권력을 [주셨다]. 부락의 공동지를 나눔으로써 농지의 경계선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 권력분배를 통해 경계선들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것을, 농지 바닥의 분배에서처럼,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했더라면 국가권력의 경계선들에 관한 어떤 논란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 경우가 아니다. 인격을 내세우시는 하나님이 생애 가운데 자신의 창조능력으로 부르셔서 권력을 할당해주신 다양한 조직은 대부분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도덕적 성격을 띤다. 학문의 고유한 삶이 있다. 예술의 고유한 삶, 교회의 고유한 삶, 가정의 고유한 삶, 도시나 마을의 고유한 삶, 농업의 고유한 삶, 공업의 고유한 삶, 상업의 고유한 삶, 복지의 고유한 삶 등등[이 있다]. 이 모든, 여전히 수많은 다른 신적 조직들 옆에 국가의 조직도 있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다. 왜냐하면 이 조직들은 각기 “고유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기 소유하는 권력을 국가의 선함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직접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 위에 권력을 가진 것은 국가가 그에게 그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나머지 이 모든 조직들로부터 구분되는 것은 모든 나머지 조직들이 사적인 성질의 [권력]을 가진 반면에 정부만이 공적 권력을 가진다는 것뿐이다.
카이퍼에 따르면 조직들 간의, 개인들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만이 개입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데, 이것이 공권력이다. 또한 정부는 각 조직들과 개인들이 각기 자기 영역에서 고유한 삶을 실현하고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결코 개입하지도 침범하지도 말아야 할 경계선은 바로 양심의 영역이다. 양심의 자유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정부는 개인의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선서도, 군복무도, 학교방문도, 예방접종도, 또는 더 있을 그와 같은 것들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범죄자들의 양심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
카이퍼 당시 국회(Staten-Generaal)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와 너무 다른 성격이다. 그는 국회를 정부가 아닌, “집중된 국가”(de geconcentreerde natie)로 정의한다. 그는 반혁명당이 “유권자들와 당선인들 사이의 도덕적 유대관계에 힘입어”(krachtens de zedekuhje babd tusschen kiezers en gekozenen) “국가권력”(het staatsgezag)에 국회를 통해 정당하게 “국민영향력”(volksinvloed)을 행사하고 확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국회가 정부와 같은 국가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반혁명당의 입장과 달리, “국회는 정부의 속성인 권력의 일부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혁명의 자녀인 자유주의자들(liberalisten)과 보수주의자들(conservatieven)이다. 국회는 “왕에게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om voor het volk bij den Koning te pleiten) 등장한 ‘일종의 몸’(eenlichaam)이다. 따라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부에 주신 국가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는 없다. 정부권력인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각기 독립일 수 없다.
Ⅷ. 결론
카이퍼가 주권국가로 인정한 네덜란드 왕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과 다르다. 카이퍼의 국가관은 오늘날 법치주의(constitutionalism) 원리나 국민주권주의와 출발점부터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2절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democracy)의 핵심이자 국민주권주의의 정치원리다. 이와 달리 카이퍼는 국가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보며 군주제도를 주창하기 때문에 군주주권과 군주에 의해 구성된 내각인 정부의 주권을 지지한다.
카이퍼의 네덜란드 국가는 두 가지 핵심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완전히 다르다. 카이퍼의 따르면 첫째로, 국가의 주권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네덜란드 국가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정부 형태가 아니라, 왕가에 의해 세습되는 왕이 최고통치자인 왕국의 정부 형태라는 점이다. 국가 주권의 원천이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카이퍼의 주장과 국가 통치체제로서 군주제도에 대한 그의 인정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출발점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카이퍼는 혁명의 기치에서 유래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비판한다.
카이퍼가 프랑스 혁명을 배격하는 반혁명을 정치적 기치로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프랑스 혁명이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 전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주인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은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카이퍼가 보기에 혁명은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는 광기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혁명의 이상적인 주장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결국 그 이상에 눈먼 대중들을 등에 업고 누군가 주인행세를 하든지 아니면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할 것이다.
카이퍼는 실제로 프랑스 혁명의 결과와 여파가 상당히 심각하게 유럽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특히 네덜란드가 벨기에 혁명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던 혼란스러운 역사 한복판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리고 흐룬 판 프린스터러르에게 감명을 받고 그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정치에 입문하여 흐룬 사후에 흐룬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반혁명당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었다. 이때는 오늘날과 같은 정당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지만 후대 정당제도가 네덜란드 정치에 자리를 잡도록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다. 반혁명당을 정치적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카이퍼이고, 그 당의 정치적 선언문이 「우리의 강령」이다.
카이퍼가 국가를 일종의 기관(organisme)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특이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카이퍼만의 특이한 국가관이 아니라, 19세기 유럽의 일반적인 국가관 가운데 하나인데, 당대의 유행이라기보다는 유럽이 역사적으로 오래 동안 국가나 사회(maatschappij)와 같은 단체나 집단을 마치 교회처럼 하나의 ‘몸’(corpus)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이다. 카이퍼가 오늘날 국민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회인 정당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기독교 민주주의였다. (끝)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