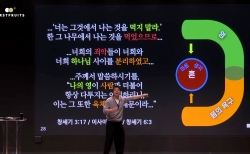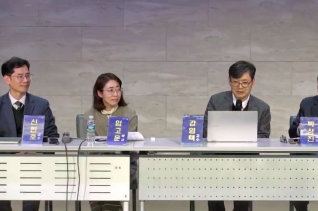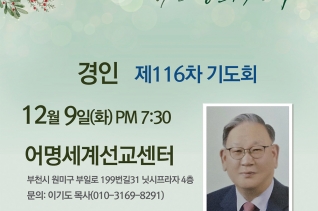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기에 ‘교회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공식이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지배해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한국 교회의 오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땅을 구원하고자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구현하고 있는가?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저자 최종원 교수(캐나나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VIEW)는 역사를 매개로 교회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탐색해 온 인문학자로서 교회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며 길어 올린 15가지 주제를 성경 말씀에 잇대어 실천적으로 담아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한국교회에 성경에 매이지 말고 상황으로 걸어 나오라고 외치고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평강은 있으되 평화는 없고, 공의를 외치지만 정의에는 무심하고, 은혜는 넘치나 은총은 희귀하며, ‘영적’ 분별에 몰두하나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는 곳, 그것이 오늘 사회에 비치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만의 은혜, 복, 사랑을 얘기한다면, 바리새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성경을 관통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런 것일 리 없다. 지난 이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 교회가 길을 잃었을 때마다 그 모습은 한결같았다. 자기중심성 속에서 높은 벽을 치고 안전하다, 평화로다 했다. 이제 스스로 가둬 버린 장벽을 열고 경계선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 위에 서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언젠가 한국 교회가 경계 위에서 흔들거리며 중심 잡을 모습을 그려 본다. 외줄타기 장인이 땅과 하늘 사이 줄 위에 서서 부채 하나 펼쳐 들고 넘실넘실 손에 땀을 쥐는 곡예를 한바탕 보여 주듯, 한국 교회가 땅과 하늘을 이어 주는 신비한 예술을 세상에 내보일 날을 고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으니 그 몸 된 교회를 주셨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소 알려 주셨다. 모두가 환호하는 축제의 시기에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알려 주신 것이다. 사람을 보되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존엄을 깨우쳐 주어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힘써 도와주는 것, 이것을 알려 주셨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 몸의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기적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 주려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이 글은 교회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에 대한 내 나름의 반론이다. 그렇지만 현실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들이 불편하게 여길 지점들도 적지 않다. 어쩌면 그것이 이 책이 의도하는 바인지도 모르겠다. 익숙함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는 데 필요한 ‘불편한’ 동기 부여 말이다. 많이 불편하고, 많이 비현실적이고,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역사 속 교회는 그런 불편하고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것들에 그저 벽을 치는 데 머물지 않고, 그것들을 마주해서 새로운 역동을 생성해 왔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이 사회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할 당위와, 그렇게 할 저력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여전히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하는 나는 누가 뭐래도 ‘교회 근본주의자’이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