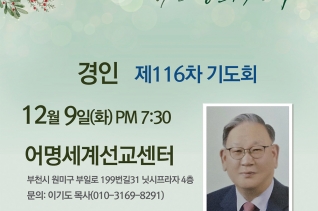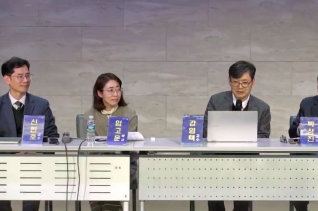혀가 바늘이 되다
시인 이종윤
입안에 혓바늘이 돋았다
혀가 바늘이 되자
내가 하는 말을 내 혀가 찌른다
혹시 내 말이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아픈 바늘이 되었나
고통 속에 생각한다
몸이 하는 말을 들으며
남에게 하는 내 말은
내 온몸으로 하는 말이니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말이니
남을 바늘로 아프게 찌르게 하지 않을
한 마디라도
행복한 말을 하기로 결심한다
아침 일찍 서둘러 일어나 서울 가는 고속버스에 올랐다. 고대 안암병원 신장내과와 비뇨기과 정기진료를 위해 가는 길이다.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순환기내과와 소화기과도 정기진료를 다닌다.
오늘은 8시간 금식 후 채혈과 소변검사, 비뇨기 검사를 위한 CT 촬영도 있다. 그리고 두 시간 후에 검사결과를 보면서 각각 담당 교수에게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내려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 전철을 기다리다가 바로 이 시를 만났다. 오픈 도어 앞에 서 있다가 유리에 적힌 시를 본 것이다.
두세 번 반복해 읽다가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을 탔다. 약수역에서 환승해 안암역으로 가면서 다시 이 시를 음미해본다. 입안의 혓바늘이 자신을 찌르듯 내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바늘이 되지 말자고 다짐하는 시인의 마음을 곱씹어 본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말하며 살아온 걸까? 시인의 말처럼 나를 찌르고 누군가를 찌르는 바늘 같은 말을 쏟아 놓은 건 아닐까?
필자는 은퇴 후에 지역신문과 교계 신문에 칼럼을 발표해 왔다. 과연 내 말이 바늘 같지는 않았을까? 내 글이 실리는 오피니언 지면의 글들도 상당수가 바늘류의 글들이 많다.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나름으로 사회를 진단하고 따끔한 일침을 놓는다. 특히 정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매일 쏟아진다.
칭찬하거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의 기능이 비판만 있고 지적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닐 것이다. 때론 숨어있는 미담을 찾아내고 격려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순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 금세 안암역에 도착했다. 채혈을 위해 대기하는 센터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
“당신의 말과 행동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캠페인 슬로건이다. 시인의 논지와 다르지 않다.
채혈 후 기다리면서 이런 글을 보았다.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위해 폭언과 폭행을 금해 달라”라는 글이었다. 바늘 돋은 폭언은 사회 공동체 안전을 무너뜨린다. 안전이 흔들리면 모두가 위험해진다.
이런 포스터를 보고 나오는데 전에 보았던 캠페인 전시회를 보았다. 고대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글을 모아 발표한 것이다. “암 경험자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고잉 온 다이어리 전시회”였다. 행복일기, 감사일기, 칭찬일기, 의료진감사일기로 구분해서 전시하고 있다. 암 환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행복을 찾아보고 감사를 찾아보게 했다. 특히 누군가를 칭찬하게 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자신을 치유하는 데에 도움이 될 터이다.
그리고 암 환자들이 건강한 이들에게 건네는 조용한 함성이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시인의 시 말미를 되뇌어 보았다.
“남을 바늘로 아프게 찌르게 하지 않을 한 마디라도 행복한 말을 하기로 결심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