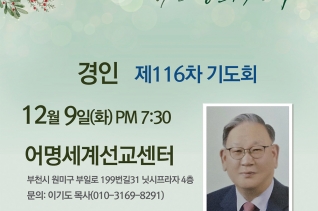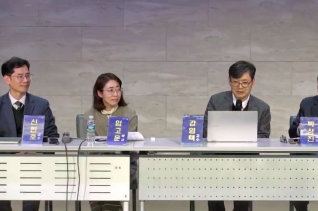성공회 김규돈 신부가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파문이 일자 김 신부가 속한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그의 사제직을 박탈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합성 사진과 추락을 기원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글을 올려 논란을 부른 천주교 박주환 신부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소속의 김 신부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윤 대통령이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한 말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글이 공개되자 큰 파문이 일었다. 성직자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맘에 안 든다고 어떻게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온 국민이 염원하자”는 글을 쓸 수 있으며, 그런 글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았다.
비판이 커지자 김 신부는 “페이스북에 ‘나만 보기’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하고, 요 근래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저의 사용 미숙임을 알게 된다.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하고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가 놀라운 건 대통령 전용기의 추락을 염원하는 등의 저주를 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난이 쏟아지자 겨우 ‘사과’라는 단어를 꺼내기는 했는데 ‘뉘우침’이 아닌 ‘자기변호’였다. 자신의 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글이 조작 미숙으로 외부에 공개된 걸 후회한다는 뜻이다.
성직자가 타인에 대해 분노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어도 되는 상황은 가정하기조차 쉽지 않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극도의 인권 탄압이 자행되던 시절에도 성직자들이 거리에 나가 몸으로 항거를 하면서도 분노를 저주로 바꾸지는 않았다. 그건 성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품성에 속하는 문제다.
교계는 충격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교회연합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성직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 전용기를 ‘온 국민이 염원해서’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썼다니 충격적이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했다. 이어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낼 자유는 있으나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길 염원한다 등의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는 섬뜩한 살기(殺氣)”라며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지...”라고 했다.
파문이 커지자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김 신부를 면직 처분했다. 면직은 사제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교회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이 조치로 김 신부가 맡은 성공회 원주 노인복지센터장과 원주교회 협동사제를 비롯한 모든 성직이 박탈됐다. 대전교구는 입장문에서 “어떻게 생명을 존중해야 할 사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전용기의 추락을 염원할 수 있느냐”며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성공회 신부의 대통령 전용기 추락 저주에 이어 이번엔 천주교 신부가 쓴 거의 똑같은 내용의 SNS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올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글귀와 함께 기도하는 어린아이 모습 사진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항의하는 댓글마다 거부한다는 뜻의 ‘반사~’라는 댓글을 달았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성공회보다 하루 늦은 15일 박 신부를 정직 처리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천주교 측은 박 신부의 언행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남과 동시에 교회의 공적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사제직을 박탈한 성공회와는 달리 신부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를 대하는 온도 차를 느끼게 했다.
두 신부가 속한 성공회와 천주교의 해당 교구가 두 사람에 대해 인사조치와 사과 표명을 동시에 한 건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속하게 사제직을 박탈하고, 또 정직 처분을 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언행을 일삼는 성직자가 어디 이 두 사람뿐일까.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비난의 화살을 일시적으로 피할 순 있어도 이들이 뱉은 저주를 상쇄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나와 뜻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죽어버리라는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다고 그 사람이 죽거나 불행해지겠는가. 자신이 쏟아낸 저급한 언어의 배설물은 결국 자신이 뒤집어쓰게 돼 있다. 천주교 박 신부가 자신의 글을 지적한 사람들에게 “반사~”라고 하더니 결국 자신에게 “반사~”됐듯이 말이다.
다만 두 신부의 ‘저주’에 분노한 민심의 불길이 종교계와 전체 성직자를 비하하거나 매도하는 데로 옮겨붙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성직자란 하나님이 주신 뭇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이다. 이번 기회가 성직자들이 각성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나무와 숲을 혼동하는 집단 인식의 오류 또한 매우 위험하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