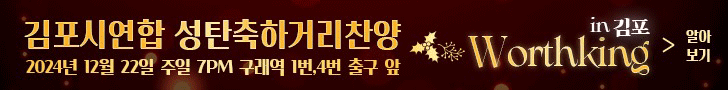코로나 이전과 이후, 아이의 언어발달 과정이 변했다. 전문가들도 어릴 때부터 마스크를 생활화하면 언어 습득 과정이 지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의 아이도 그렇다고 볼까? 물론 아이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은 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활동 영역이 이전보다 많이 좁아졌다. 하지만 아이의 언어 습득 과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눈을 맞추며 수어를 배워가는 시간이 늘어나며 엄마와의 상호 작용이 한층 더 깊어졌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가 이런 이점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기다리는데 아이가 내 허리를 톡톡 두드리더니 이내 손가락으로 뭐라 말했다. 다시 물어보니, '화장실'이라는 수어였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며 '기다려'라는 수어로 답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동차가 바삐 지나가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소통하는 요즘이다.
"엄마, 한 번 더!", "엄마, 더 주세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수어 표현을 알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대견하다 싶기도 하다. 물론 마스크의 생활화로 이전보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보급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도 함께 할 수 있듯이 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가운데 교육 시스템, 특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 환경에 노출되는 방향이 적용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바깥에서 다양한 언어 환경을 접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은 특히 가정 안에서 많은 소통을 해야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 된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다. 그렇다면 필자도 수어로 충분히 눈 맞춤을 거쳐 상호 작용하다 보면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에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꼭 말을 느리게 시작하거나, 어눌하다는 의견이 맞고 틀렸다는 편견을 떠나 다양한 소통 방법이 있다는 것이 사회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샛별 작가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