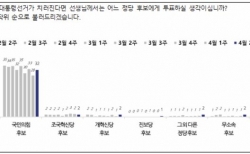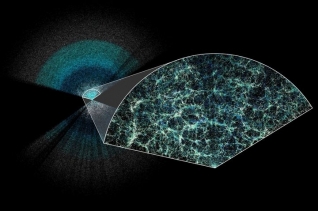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신(新)재정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이날까지 이틀 동안 유로존 채무·금융위기 해소 대책을 논의한 끝에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과다채무를 막기 위한 일련의 방안들이 담긴 재정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영국이 거부하고 일부 국가가 의회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뤘으나 기존 유로존 17개 국가 외에 최소한 6개 비(非)유로존 국가가 새로운 재정 체제에 참여키로 해 재정통합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3월 확정될 새로운 재정 체제 참가국들은 재정적자의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는 '황금률'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자동적으로 처벌받게 되며, 황금률을 헌법이나 법규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도록 권장된다.
참가국의 예산 편성단계부터 재정을 규율하는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역할이 확대된다.
하지만 신재정체제는 조약의 개정을 통해 EU의 공식 체제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간 합의체'여서 규율의 집행과 처벌의 강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들에도 합의했다.
우선, 유로존 국가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2천억 유로를 추가 출연하고 IMF가 자체 자금을 보태 유로존 위험국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상회의는 또 한시적 기관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대체해 2003년 출범할 예정이던 유로안정화기구(ESM)를 1년 앞당겨 내년 7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두 기관의 병존 기간이 1년이지만 EFSF의 기금 가용 잔액 2천600억 유로와 EMS의 기금 5천억 유로를 더해 위기 진화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ESM에 은행 역할 부여하는 방안은 독일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시장은 물론 EU 집행위도 근본적 대책이라고 거론해온 유로채권 발행 역시 독일 등의 저항으로 일단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