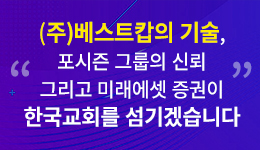【스카스데일(미 뉴욕주)=AP/뉴시스】뉴욕주 화이트 플레인스에 사는 캐롤린 은보콜리(37)는 유방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4살과 6살 아들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아들들을 사랑했는지,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는지, 엄마가 가고 난 오랜 뒤에도 어떻게 해야 착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동영상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19세 때 모친이 사망했지만 사진 외에는 남은 게 없어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확실한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 '스루 마이 아이스'( Thru My Eyes )란 비영리 봉사단체에 제작을 신청했다.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는 건 새로운 일은 아니다 . 하지만 1993년 마이클 키튼이 "나의 일생"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남긴 이래 유언 비디오는 삼각대에 받쳐놓은 촬영기를 향해서 혼자 말하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형식에서 벗어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의료 전문가들이나 제작자들이 유언을 남길 부모들을 사전에 면담한 후 주로 암에 걸린 중환자들의 항암제 치료 기간 사이에 날을 잡아서 되도록 재미있게 내용을 전개해가는 경우가 많다.
제작진은 암이나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마음 편하고 친근하게 인터뷰나 각종 형식을 담아 유언 비디오를 제작한다. 하지만 "네가 이것을 볼 때에는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라는 말을 하는 건 역시 모든 환자들에게 고문에 가까운 고통이다.
그래도 말기암 환자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자신의 '돌봄'을 남기는 이 무료 동영상 제작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병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자원봉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스루 마이 아이스'는 암 환자 출신으로 병을 이겨낸 생존자들에 의해 창설된 단체로 암 환자들의 고통이나 마지막 원하는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호응이 크다고 뉴욕 장로교단 병원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앤젤라 헬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