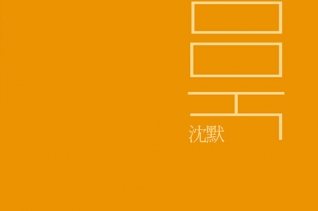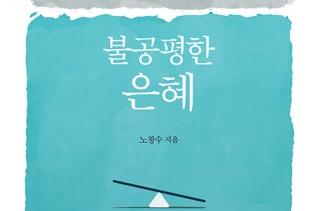최근 미국의 버락 오바마의 재선으로 마무리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교계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한계를 보였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남침례신학교의 앨버트 몰러 총장은 이번 선거에 대해 “복음주의에겐 재앙”이라고 평했다. 이번 선거는 ‘기독교적 정책을 가진 몰몬 후보’냐, ‘반기독교적 정책을 가진 기독교인 후보’냐 하는 대립구도를 띠었다. 교계는 동성애와 낙태, 피임을 지지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강한 반대 경향을 보였다.
예상대로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79%가 롬니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부시 대통령 재선 당시와 동일한 비율이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복음주의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복음주의권의 동일한 지지를 얻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당선되고 롬니 후보는 낙선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복음주의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다.
몰러 총장은 “우리의 메시지가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거절당했다는 뜻”이라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한 스토리와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며 “4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일부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것은 미국의 도덕적 이슈에 대한 인식이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 설명했다.
오바마의 조언자이자 웨슬리신학교의 교수인 숀 케이지 씨는 “그동안 복음주의자들의 표는 킹메이커 표로 인식됐지만 이젠 그 세력이 죽었다(dead)”고 직설했다. 그는 “빌리 그래함 목사가 (사실상 롬니를 지지하는) 전면광고까지 냈지만 별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퓨리서치포럼의 선임연구원 그렉 스미스 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던진 표가 다른 그룹의 민주당 지지도를 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흑인 개신교인의 95%가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했으며 4분의3에 해당하는 라티노 가톨릭 신자가, 10분의7의 유대인, 70%의 무종교인이 오바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지메이슨대학교의 마크 로젤 교수는 “복음주의자들은 릭 페리, 미쉘 바크먼, 뉴트 깅리치, 릭 샌토럼 등을 지지하며 몰몬인 롬니 후보를 멀리해 왔다. 정작 롬니가 후보가 되자 이들의 힘은 결집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1980년대와 90년대의 팻 로벗슨이나 제임스 돕슨과 같은 영감 어린 지도자도 이번엔 없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몰러 총장은 “이제 복음주의는 정치에 대해 근본적이면서도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젊은 미국인과 라티노, 다른 소수자 그룹에 다가가지 못하면 우린 퇴물 공동체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