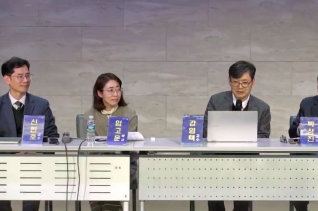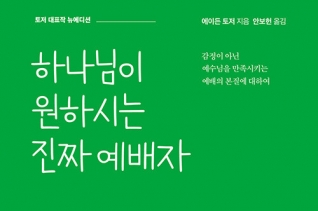[기독일보=사회·문화] 지난달 26일 개봉해 개봉 4일만에 누적 관객수 4만 명을 넘어서며 한국 기독 다큐 중에서 최고 흥행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관객과의 대화(이하 GV 시사회)가 지난 2일 오후 8시 대한극장에서 진행됐다.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32살의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서서평(본명: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선교사 7인' 중 유일한 한국 파견 선교사이기도 하다.
이 날 GV 시사회에 참석한 '스윗소로우' 김영우와 이다혜 씨네21 기자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래는 이날 이 기자와 김영우의 영화에 대한 대담이다.

#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스윗소로우 김영우(이하 김): 영화 맨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Not success, but service" 스윗소로우의 많은 팬들도 와계시지만 "예수 믿으세요, 제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며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한다 한들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기가 쉽겠죠.
하지만 서서평 선교사님이 보여준 리더십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낮아져서 그 사랑을 전한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결코 내 머릿속 이성으로 생각하고 계산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영역의 길들이었다고 봐요.
이다혜 기자(이하 이): 저도 초반부터 울컥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을 때 당시의 조선 사람들이 서평에게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라고 했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려고 해도 스마트폰을 켜서 지명 검색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어요. 동네 마트가 있는지 한인식당이 어디에 있는지도 검색할 수 있고요. 이 영화는 1920년대부터 나오는데 이 시기에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을 자기가 지키는 이야기이라는 면에서도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영화에서 서서평 선교사의 선교사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안에 섞일 수 있는가 신기할 정도라는 거에요. 또 서서평 선교사가 돌봤던 환자들이 가진 병이 한센병이란 말이죠. 전장 같은 곳에서 어디가 부러지고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구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전염될 수 있다라는 공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결심이 굉장히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시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 안에 들어간다는 느낌에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운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영화가 구성되어 있었다고 보고요.

# 영화 전개도 '천천히, 평온하게'
이: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감동적인 다큐 특히나 휴먼 다큐라는 것을 보시면 보는 사람은 아직 울 준비가 안됐는데 갑자기 음악이 깔리고, 등장인물들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에요. 너무 슬픈 사연이기 때문에 같이 울긴 울지만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고 나를 억지로 울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약간의 불쾌감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선을 너무 잘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지혜로움이 어떻게 보면 인물 자체의 특성과도 잘 맞는 연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 너무 감동코드로 울렸으면 '천천히 평온하게'의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연기자들이 폭풍연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다큐멘터리이면서 극 영화적인 부분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은 관련한 학자들의 인터뷰 클립을 따와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배우들이 일종의 재현 연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다큐 부분과 재현 연기를 하는 부분과의 균형도 이 영화를 감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큐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TV 다큐 같은 형식에 근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인상이 들지 않는 이유는 연출을 굉장히 지혜롭게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현 연기에도 일단은 대사가 많지 않고 대체로 내레이션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레이션 하고 있는 하정우씨 연기력이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로 연출된 부분과 극영화로 연출된 부분을 하정우씨가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주고 있다는 인상도 있었어요.
김: 저는 자연의 이미지들이 잘 섞인 것들이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흙의 이미지, 하늘의 이미지, 바다의 이미지 그런 자연을 통해서 신을 느끼는 거죠.
이: 인간이 절대 창조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 이런 자연을 통해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그의 의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과 맞닿아있는 것을 계속 중간 중간 느끼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이 영화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좋은 면이었던 것 같아요.
# 끝까지 욕심 없이
이: 그리고 영화가 길지 않잖아요. 이게 1시간이 약간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길이도 굉장히 짧은 편인데 길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다큐멘터리같이 등장하는 인터뷰 클립들을 보시면 연출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찍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멀리까지 갔다 왔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보여줄 것이 많이 있었을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야기를 확 늘였다고 한다면 지금 받는 식의 정말 뒤끝이 굉장히 좋은 그러면서도 울림이 강한 감동보다는 너무 늘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의 강약조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강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를 짧게 만든 게 더 유효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 사실 우리가 1시간 반이나 1시간 40분의 영화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화가 약 한 시간 너머의 길이를 준 것은 나머지 20분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계속 삶으로 이어지게끔요.
지금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 스스로 느끼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인 비리에 연루된 사람 중에 왜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지 생각해보면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 나는 과연 잘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보게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없었던 사람들,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던 기독교가 지금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장 힘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기독교가 된 것도 같고요.
기독교 안에서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기도제목이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시고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스윗소로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해 본적이 있나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보게 된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 기독교에 강한 도전을 주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영화 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남아 있을 것 같은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 좋았네요. <끝>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