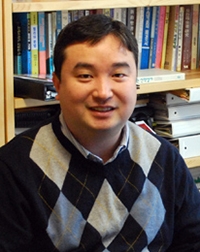
[기독일보=김종민 목사] '우리'라고 하는 말만큼 안정을 주는 말이 없다. 별 의미 없는 집이라는 단어에 우리라는 말을 갔다 붙이면 '우리 집'이 된다. 그 순간 이 말은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안정을 주는 단어가 되고, 그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라는 말은 동질성,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 말이다. 우리라는 말 앞에서는 가족과 같은 동질성을 느끼고 덜컥 무장 해제가 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지 말할 때, 좋은 것에는 다 '우리'라는 말을 갔다 붙이곤 한다.
하지만 이 '우리'라는 말은 동질성이 강할수록 배타성도 강하다. 우리에게 속하면 말 그대로 우리 편이지만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면 이질적이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우리가 아니면 남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며 경쟁의 상대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문화적, 민족적 동질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더욱 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
동질성과 배타성의 양 날을 가진 '우리'라는 개념을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하면 '우리'는 큰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두 국민 전략'이다.
두 국민 전략은 국민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정권에 협조적인 국민에게는 당근을, 반대하는 국민에게는 채찍을 사용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통치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말이 좋아서 두 국민 전략이지 속되게 말하면 '국민 이간질 전략'이다. 우리 편에 서면 한 없이 자애로우나 우리 편이 아니면 교화 대상이나 적과 다름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비열한 통치 전략이다.
그러나 이런 두 국민 전략이 사회 전반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특히 세수부족으로 인한 정부 복지 정책 축소에서 이런 면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 무상교육지원 정책을 축소하면서 정부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소위 말하는 '워킹맘'에게는 우선적 혜택을 주고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은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정책의 효율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정책은 의무교육 축소에 대한 반발을 정부에게 돌리는 대신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싸움으로 돌린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와 전업 주부라도 다 노는 줄 아느냐 하는 대립구도는 정부 정책의 실패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소재로서는 적격이다.
얼마 전 경상남도는 의무급식을 폐지하고 선별적 급식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두 국민 정책이다. 의무 급식을 받는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은 구분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소득 상위계층이 의무급식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제외되는 평균소득 가정은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재정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돌린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책변화로 다시 의무 급식이 시작되면 의무급식 대신 서민 가정 자녀에게 갑자기 지원되었던 교육비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에는 또 하나의 박탈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두 국민 전략은 단 기간 자신들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지역 차별, 빈부격차 심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사회에서 두 국민 전략은 독이 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쉽게 빠져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라는 정치적 수사가 주는 안락함에 빠져 있는 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문제와 마주치며 극복해 가는 과정은 여러모로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나와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을 나에 대한 공격이나 인격모독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더 넓은 '우리'의 상생을 생각해야 할 때다.
글ㅣ김종민 목사(애틀랜타성결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