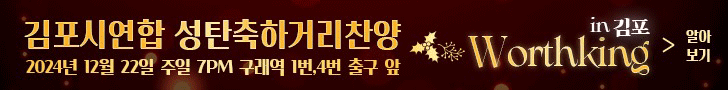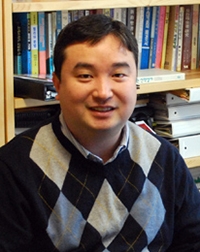
자본주의의 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소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생산해 내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비하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를 결정한다.
혹시라도 깜빡 돈 쓰는 것을 잊어버린 게으른 소비자를 위해서,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새해에 이르기까지 천지 사방에서 우리의 지갑을 털어대는 쇼핑의 대 시즌이 시작된다.
한 해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또한 함께 해 준 가족과 고마운 지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 원래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선물이 이제는 그 가격이 그 고마운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기대하는 선물은 아빠 산타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어른들도 시즌에는 뭔가 크고 근사한 것을 사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신문과 이메일에 딸려오는 수 많은 전단지들은 저마다 미끼 상품을 내 놓고 소비자의 입질을 기다린다. 그런 물건들을 사지 않으면 왠지 큰 손해를 보는 느낌까지 들곤 한다.
하지만 밤늦게 줄을 서 가며 한 가득 사온 것들도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닐 때가 많다. 집에는 그래도 아직 쓸만한 물건이 넘쳐 나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는 그런 물건들이 열두 시를 넘긴 호박 마차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상실된 마음의 반영이다. 마음이 허한데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철학적인 사유를 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는 무리다. 그저 집안을 새 것들로 채우고, 작년보다 더 큰 텔레비전을 거실에 놓는 것으로 연말의 허함은 잠시 채워질 것으로 믿고 싶어 할 뿐이다. 그러나 물질은 물질이고 마음은 마음이다. 물질로 마음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잃어 버린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 받고 싶은 마음, 미안한 가족에게 무엇인가 보상해 주고 싶은 마음, 패배자가 아니라는 증거, 살아 있다고 느끼는 그 뜨거움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은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물건들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장 앞에 있는 자선 냄비에 동전 한 개, 지폐 한 장 넣는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을 해야만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귀찮다고 집에 있는 쓸만한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잘 닦아서 재활용품 매장에 기부하는 것도 사랑을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런 것은 위선이라고! 네 자신이 너를 위해 쓰는 돈을 생각해 보라고. 그 몇 푼이 너의 가식을 덮을 줄 아냐고.
그러나 소시민들의 그런 위선들이 모여서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있다. 그 위선을 통해 세상의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의 위선은 거짓이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사랑의 표현이다.
더 하라는 것이 아니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도 그 부끄러운 손길을 멈추지는 말라는 말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지만 시작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그 부끄러운 손을 덥석 잡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손을 움츠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남은 한 손도 내밀어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세상을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힘주어 꽉 잡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