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항균에 삶음 기능까지 갖춘 세탁기들이 바글바글했다"
가전제품 매장을 묘사한 문장이 아니다. 세탁기로 대체된 이는 그저 그런 이력으로 취직에 번번이 미끄러지는 소설의 주인공 '철수'다.
소설 '철수사용 설명서'(전석순 작, 2011 오늘의 작가상)는 20대 청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상품화되고 소비되는지를 자못 불편한 방식으로 기술한다.
소설에서 구직자는 매장에 놓인 가전제품과 다를 바 없다. 이것저것 스스로 성능을 갖추고선 기업에 선택되기만을 기다린다.
애초 기계의 사양을 뜻하는 'specification'의 한국식 약어인 '스펙'은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람에게 쓰인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자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끝을 모르는 '스펙 무한경쟁'에 뛰어들었다.
입사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게 아닌 입사 경쟁자보다 비교우위를 차지하려다 보니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스펙을 쌓아야 했다.
이러다 보니 스펙의 과잉 현상이 생겨났다. 입사에 굳이 필요없는 스펙을 갖춰야 하는 '오버 스펙'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전석순씨는 "스펙 경쟁을 하다가 모두 천재가 될 판이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1990년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김모(48) 부장은 "입사할 때 낸 토익 성적이 600점을 조금 넘었던 것 같다"며 "그때는 대학생이 적었고 일자리가 많아 사실상 대학 졸업장으로 4학년 1학기에 웬만한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 회사에 올해 입사한 정모(29)씨는 '백수' 생활을 1년여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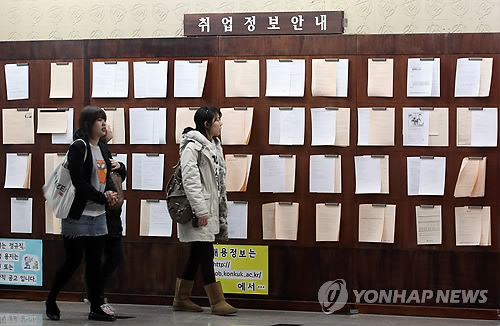 |
|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대학생들 (자료사진)
|
정씨는 토익이 만점에 가까운 970점, 학점도 재수강을 반복해 3.9로 높였다. 캐나다로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중국어 자격증과 광고 공모전에서 입상 경력도 보탰다.
정씨는 "요즘은 스펙 때문에 해병대를 가는 친구도 있다"며 "입사 지원서에 남과 다른 특이점을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과 정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20년 만에 진입 장벽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아진 셈이다.
삼성그룹의 한 계열사 인사담당자는 "2000년 이전만 해도 대졸 신입사원 중 토익 3등급(620점) 이상이 전무했다"며 "90년대 초반엔 토익 1등급을 따면 130만원을 주고 토익 학원비도 전액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공식적으로 입사 시 토익 점수 하한이 730점인데 거의 다가 900점대"라며 "석 달 전 대졸 신입사원을 설문조사해보니 해외 연수자가 80%가 넘었고 석사 학위자도 80년대 후반엔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라고 전했다.
토익 시험을 친 구직자의 평균 점수는 2000년 580점에서 2005년 617점, 지난해 639점으로 10년 만에 60점이 올랐다. 너도나도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경쟁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의 구직자 토익 평균 점수는 2008년 456점, 2009년 460점, 2010년 485점으로 같은 기간 한국보다 154∼180점이나 낮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0∼50대 직장인을 설문조사해 보니 세대가 지날수록 고(高)스펙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해외연수를 했다는 답은 50대가 2.0%인데 비해 20대는 10.4%였고 어학 자격증은 50대가 10.2%였지만 20대는 52.4%로 차이가 벌어졌다.
공모전 도전, 인턴, 봉사활동 경험을 했다고 대답한 직장인도 20대는 그 윗세대보다 훨씬 많았다.
 |
|
<그래픽> 한국 구직자 평균 토익점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ETS, 한국은행 자료. 한국.일본 구직자 연도별 토익점수 및 양질의 노동력 및 일자리수 추이.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그러나 비정규직이나 하향지원을 해봤다는 응답은 40·50대가 25% 정도였지만 20대는 46.8%로 높았다.
대학 졸업 당시 입사희망 기업이 대기업이었다는 답은 50대가 49.0%였으나 20대는 28.6%였다.
20대가 그 이전 세대보다 취업 스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진 것이다.
취업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일단 대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3년 167만명(대학원생 포함)이던 대학생 수는 2010년 313만명으로 배가 늘었다. 2008년 전문대 이상 대학 진학률은 83.8%로 일본(56.2%), 미국(53.2%), 프랑스(41.0%), 독일(35.4%)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 인구에서 대졸 이상의 비율이 1985년 10.0%, 1990년 14.1%에서 2005년 31.4%로 뛰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박사는 "4년제 대학생이 20년 만에 급증했지만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 등 이들이 갈만한 일자리는 이에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런 불일치 때문에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려고 스펙 경쟁이 과열됐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3년 양질의 일자리는 양질의 노동력보다 55만개 많았지만 1997년을 기점으로 역전됐고 격차는 점점 벌어져 지난해엔 일자리가 384만개나 적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교수는 "기업이 21세기 들어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몰랐던 게 스펙 경쟁의 원인"이라며 "세계화 시대가 됐다고 해 일단 영어가 필요할 것 같아 영어와 성적 우수자를 뽑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학생들도 자기 능력을 개발해 취업하고 싶은데 뭘 개발해야 수요자가 원하는지 모르다 보니 당장 수치로 나오는 영어와 학점에 집중했고 회사는 회사대로 스펙이 좋은 학생을 뽑았는데 업무 성과는 나지 않자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