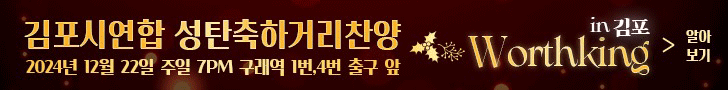A(40)씨의 고통은 2년 전 시작됐다. 전날 밤 아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그는 새벽 4시50분 눈을 떴다. 이상하게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났다. 닫힌 안방 문을 강제로 제낀 A씨의 눈 앞에 '지옥도'가 펼쳐졌다.
시커멓게 그을린 방 안. 두살배기 아들은 천장을 바라보고 미동도 없이 바닥에 누워있었다. 공포와 고통 속에서 엄마와 아빠를 찾아 헤맨 것인지 발바닥은 새까매져 있었다. 아내 B씨는 침대에서 정신을 잃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구석에는 번개탄이 놓여있었다. '영아살해'였다.
지난 2018년 12월16일 생활고와 가정불화,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아이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아내의 잘못된 선택으로 A씨 집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손주를 너무나도 예뻐했던 장인은 아기의 죽음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지도 못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와 장모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아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은 집을 떠나 1층으로 이사했다. 혹시 기억을 되찾은 아내 B씨가 뛰어내릴까봐 우려돼서였다.
A씨는 '어쩌면 사망진단서에 서명하기 직전 기적적으로 눈을 뜬 아내가 더 행복할 지 모른다'고 회상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화장실 가는 길도 못 찾는 '천치'가 된 B씨는 자신이 저지른 참담한 사건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A씨 아내는 생활고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집안은 지난 2017년 두 번에 걸쳐 A씨 사업이 부도가 나 빚더미에 앉게 됐다. A씨는 공장에 나가면서 월 275만원을 벌었지만 차 할부금과 월세, 대출 등으로 233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는 거의 매일 같이 부부싸움을 했다. B씨는 임신 후 4개월 무렵부터 우울증을 앓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달 29일 B씨에게 살인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식의 판에 박힌, '메뉴얼 같은' 양형 이유만을 전하고 판결을 끝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마치며'라는 순서를 마련, 잇단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슴에 새겨야 할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약 6페이지에 걸쳐 남겼다. 박 부장판사는 저서 '어떤 양형 이유'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기도 하다.
'마치며'의 첫번째 주제는 '아동은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였다. 여기서 재판부는 "성별과 국적, 피부색을 떠나 모든 인간이 천부의 인권을 갖듯, 나이 어린 인간도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며 "생장하는 상당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 없이는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어린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범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그 다음 주제의 제목은 가슴을 더욱 세게 때린다. '살해 후 자살은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다.'
재판부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런 범죄는 동반자살이라는 명목으로 미화되거나 윤색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반자살이라는 워딩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살해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라며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 법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가해 부모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시각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 다섯번째 주제의 제목처럼 '우리가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난하고 마음이 불안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그 부모를 의지하기는커녕 두려워해야만 하는 이 끔찍한 현실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것 말고, 이제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할 순 있지만 일단 뛰기 시작한 가슴은 그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다"면서 최후의 메시지를 던졌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뽑아 기관을 만들어도 위기에 빠진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 의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인에 대한 연민 외에는 이처럼 극단적인 절망과 고통에 맞설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인간애로 서로 깍지 낀 두 손만이 최후이자 최선의 안전망이다. 우리가 안전망이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