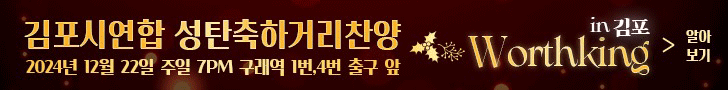젊은 소설가인 남자는 지금까지 이상형을 찾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남자는 31살이 됐다. 이제 겨우 책 한 권 냈을 뿐인데 글도 안 써진다. 아파트 단지 난간을 붙잡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그럴수록 화만 난다. 자잘한 집안 살림들을 집어 던지며 히스테리를 부리는 이 남자. 아르바이트로 바텐더를 하는 술집에서 록밴드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들리는 말은 "지금 너한텐 여자가 필요해" 정도.
그러다 설정처럼 주월은 베를린에서 희진을 만난다. 날렵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부터 "초면에 무례했다면 용서하라"는 세련된 매너까지 갖춘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찾던 바로 그 여자다. 귀국한 주월은 그동안 갈고닦은 유머러스한 필체로 직접 쓴 편지를 희진에게 보낸다.
남자가 사랑할 때, 모든 남자는 그 사랑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서툴다. 남자는 처음 걸음을 떼는 순간처럼 많은 것이 새롭고 조바심이 날 정도로 의욕이 넘친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그렇듯, 끓는 물이 식는 것처럼 뜨거운 기포가 가라앉으면 깃드는 고즈넉함 또한 연애의 일부임을 주월은 모르고 있다.
주월은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목격한다. 주월의 예상을 넘어 무성한 그것은 희진의 겨드랑이털이다. 알래스카에서는 모두들 이렇게 기른다지만 이 체모는 이제 막 무르익는 주월의 환상에 금이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채식주의자인 주월 앞에서 에너자이저처럼 돼지갈비를 뜯어먹는 희진의 식욕. 사진과 남학생들의 누드사진을 찍고 잠자리를 함께 해서 '스쿨버스'로 유명했다는 희진의 과거. 가감 없이 찍은 주월의 사진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희진의 자유분방함.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식상해진다. 주월은 조금씩 희진과 거리를 둔다.
이 소심한 남자가 택하는 이별의 방식 또한 지극히 이기적이다. 희진의 전시회에서 받은 베스트포즈상 트로피를 집어 던지며 "사진 찍은 남자들 하고 잤냐"며 추궁하는 모습에는 그의 집착과 초조함이 그대로 묻어있다. 그런 주월에게 희진은 이렇게 맞받아친다. "니가 지금 쓰는 소설에 내 이야기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니 사진 찍은 거나, 니가 나 갖고 글 쓴 거나 다른 게 뭔데?" 남자는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만 확대해서 보는 반면, 여자는 자신이 간과한 연인의 다른 점을 알고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새로운 사랑을 하는 남자와 사랑에 익숙한 여자의 태도는 이렇게 다르다.
영화는 희진의 새로운 모습만을 찾아 젊은 베르테르식 감수성으로 사랑을 미화하려는 주월의 시점으로 진행된다. 자신이 쓰는 연재소설에서 진행되는 사랑은 어디 한번 찬찬히 지켜보자는 주월이지만, 현재진행형인 자신의 사랑 앞에서 그는 자판기처럼 즉각적이다.
흑기사를 자청해 술을 마시고, 못 먹는 고기를 두 겹, 세 겹씩 상추에 싸서 먹는 주월. 엽기적인 포즈를 지으며 기꺼이 희진의 피사체가 되기를 자청하지만 사랑은 그가 쓰는 소설과 다르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헤어진 애인과 현재의 애인을 나란히 마주하는 순간 그 당혹스러움에 달아나는 주월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자신의 변화다.
<러브픽션>에서 하정우와 공효진은 기대 이상의 어우러짐을 보여준다. 그동안 기센 역할들만 전담했던 하정우가 소심한 소설가로 변한 것도 예외적인 즐거움을 준다. <미스 홍당무>와 <최고의 사랑>을 거쳐 쌓은 탄탄한 내공으로 공효진은 로맨틱코미디라는 까다로운 장르를 성공적으로 이끈다. 여성 관객들이 영화를 만끽하는 분위기였다면, 남성 관객들은 다소 담담한 모습이었다. <봄날은 간다>의 상우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21세기의 베르테르식 감수성'을 보여주는 주월이 다소 낯설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