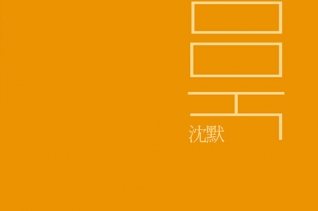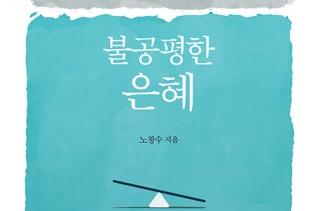인문학으로 기독교 이미지 읽기
오근재 | 홍성사 | 352쪽 | 16,000원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출간 당시 기독교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소설은 독자들에게 사실처럼 다가왔고, 기독교계는 거세게 반대했다. 소설을 바탕으로 나온 영화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홍익대 조형대학 교수와 한국그래픽디자이너협회장을 역임한 오근재 박사는 ‘다빈치 코드’로 대표되는 현상에 대해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기독교 이미지의 성서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알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해석을 위해 학문적인 도구를 찾아내 이를 이미지에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기독교 이미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결핍이라는 이 제한적인 인식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고 말한다.
그가 쓴 <인문학으로 기독교 읽기(홍성사)>는 이러한 의도로 쓰여졌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서학이나 해석학에 대해, 미술·디자인 전공자들은 미술사와 도상학, 미학 등에 나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전문성으로 아무리 해독해 봐도 그 전체성은 늘 은폐돼 있다.”
책에서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을 시작으로 미켈란젤로의 여러 작품들과 라깡의 언어학 등을 분석하며 다양한 연장을 사용해 “기독교 이미지들을 온전히 분석해내는” 작업을 시도한다.
저자는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예수의 이야기, 즉 복음서의 관점 차이를 설명하면서 다빈치가 자신의 그림을 통해 “복음서 사건에 또 하나의 해석을 덧붙인 것”이라고 말한다.
일례로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일점투시법은, 아무리 그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 해도 다빈치가 본 최초의 그 시점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며 “이 그림에는 그의 신앙 간증이 녹아있고, 우리는 그의 회화적 언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색채와 형태로 구성된 그림에서도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예수와 열두 명의 제자들이 둘러앉아 식사하지 않고, 맞은편을 비워둔 채 세 명씩 네 그룹의 일렬로 묘사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주목하는 상태로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작품상의 구도가) 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감각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작가는 직감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다빈치는 만찬 장면의 형상을 묘사했다기보다, 예수와 제자들 사이 미묘하게 번지는 비시각적인 수상한 분위기를 더 집중적으로 드러내려 했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이밖에도 많은 학자들의 사상과 주장, 여러 예술적 개념 등 다양한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성화(聖畵)를 꼼꼼히 해체·분석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킨다. 특히 5장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시대에 따라 어떤 의미로 해석돼 왔는지를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 따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