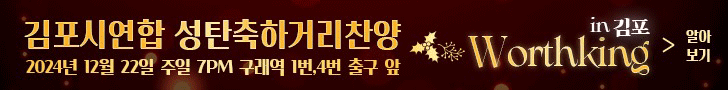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
|
지난 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한 전북 현대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자료사진)
|
2011년 프로축구 K리그에서 최대의 화제는 '닥공(닥치고 공격)'으로 요약되는 전북 현대의 공격적인 축구였다.
반면 전통의 강호로 손꼽혀온 명가는 자존심을 구긴 한 해였다.
수원 삼성은 '트레블(정규리그·AFC 챔피언스리그·FA컵 동시 우승)'을 노렸으나 무관에 그쳤고, FC서울 역시 6강 플레이오프에서 고개를 숙였다.
◇'닥공' 전북 돌풍…신흥 명문 발돋움= 2009년 우승 이후 2년 만에 K리그 왕좌에 복귀한 전북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리그에서 약체로 분류됐던 팀이다.
1994년 전북 다이노스로 창단한 이후 줄곧 중하위권에 머물다가 2000년에 '반짝' 3위에 오르긴 했지만, 그 이후 다시 성적이 내려앉았다.
현 사령탑 최강희 감독이 전북의 지휘봉을 잡은 이듬해인 200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켰으나 K리그에서는 여전히 쉽게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지 못했다.
그런 전북이 확연히 달라진 것은 2009년이었다.
'한물갔다'는 평가를 받던 이동국과 김상식을 영입해 팀에 변화를 준 전북은 역대 경기당 평균 최다득점인 2.11골(28경기 59득점)의 화끈한 공격력으로 창단 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에 오른 데 이어 챔피언전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지난해 정규리그 3위로 잠시 숨을 고른 전북은 올해 '더블 스쿼드'로 안정된 전력을 바탕으로 한층 위력적인 공격 축구를 구사했다.
정규리그 30경기에서만 67득점-32실점, 경기당 평균 2.23골을 기록하는 무서운 공격력을 자랑했다.
경기당 평균 2.23골은 2009년 세운 기존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전북은 5월21일 강원을 1-0으로 이긴 것을 시작으로 30라운드까지 무려 20경기 무패행진(12승8무)으로 정규리그를 1위로 마감했다.
챔피언결정 1, 2차전에서도 모두 승리해 22경기 무패행진(14승8무)을 달성, 성남이 2007년 기록한 역대 최다 무패행진과 타이를 이뤘다.
전북은 이렇게 '역대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공격력으로 '닥공(닥치고 공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올해 K리그를 지배하고 신흥 강호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졌다.
◇'명가' 수원·서울, 자존심 꺾이다 = 반면 수원과 서울은 K리그 전통의 명문팀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수원은 올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수 영입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트레블'을 내심 꿈꿨지만 끝내 '무관(無冠)'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FA컵 결승전에서 오심 논란 끝에 성남 일화에 우승을 내줬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는 알 사드(카타르)의 비신사적인 골로 난투극까지 벌인 끝에 결국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난투극에 따른 AFC의 징계로 골잡이 스테보가 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아 전력 손실이 컸던 수원은 K리그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희망'을 잡으려 했지만 울산 현대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 끝에 3-1로 패해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챔피언인 서울도 올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시즌을 보냈다.
시즌 초반에는 극심한 부진으로 리그 하위권으로 내려앉았고 4월 말에는 황보관 감독이 물러나는 등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임시로 지휘봉을 넘겨받은 최용수 감독대행이 초보 사령탑답지 않은 지도력을 발휘해 순위를 끌어올려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라이벌' 수원 삼성을 제치고 3위에 오르는 드라마를 썼다.
하지만 안방에서 치른 울산과의 6강 플레이오프에서 1-3으로 패하는 바람에 허무하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준우승팀 울산은 정규리그에서는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6위로 진출한 챔피언십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비록 전북에 막혀 우승의 꿈은 접었지만 철벽 수비와 조화를 이룬 날카로운 '한방'으로 서울, 수원에 이어 정규리그 2위인 포항까지 제압하며 챔피언십 승부의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불어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