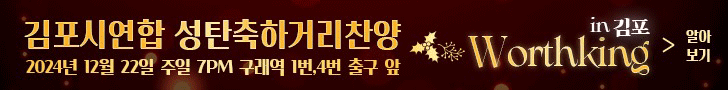어떤 뉴스가 뇌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불편함으로 남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그렇다.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선장이 살인죄에 관해서는 무죄이며 징역 36년 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죄가 인정된 자는 기관장뿐이고 나머지는 5-20년 형을 받았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더 큰 책임은 선주나 해경, 그리고 그런 노후 된 배를 사들이게 하고 운영할 수 있게 허락해준 법 기관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선원들 자신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이겠다. 또한, 선장 자신이 정말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는데 살인죄를 적용하면 정말 억울하지 않은가?
하지만, 하지만, 무고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지시를 따라 정말 가만히 있었다가 죽어간, 아니 '살해된' 304명의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에 앉으면 그 빈자리가 매일 아침 가슴을 찌르듯 한 고통을 평생 당해야 하는, 지나가는 중학생만 보아도 가슴을 움켜잡아야 하는 가족들의 평생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고 결과를 보면, 판결이 가해자의 사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판결했다면 어떠했을까?
오래 전에, 평소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미국의 한 방송사 사장이 단지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2만여 건을 내려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형량인 '징역 1000년형'을 선고 받았다. "포르노 속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모두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다(조선일보, 인터넷판, 2013년 3월 2일). 만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세월호에 대입했다면 어떠했을까? 선장의 살해 의도와는 상관없이, 물속에서 죽어간 한 학생 한 학생 모두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판결의 중심을 두었다면 어떠했을까?
혹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렇게 큰 벌을 주어서 무엇 하느냐, 그저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미덕이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눈 감아 주지 않으셨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이 선고는 영벌의 사형이었다. 그리고 그 집행은 자기 친 아들에 대한 십자가의 고통스런 사형이었다. 무서운 공의로 다루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구약의 보복법이고, 신약은 원수사랑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도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다. 자유인이나 지주들에 비해 노예나 소작농이 과반수에 육박했던 고대 사회에서 '눈에는 눈'이라는 법은 거의 혁명적인 인권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원래 창조신학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했다. 당시 이방 사회에서 최고의 법이었던 하무라비 법전도 쫓아오지 못했을 만큼 선진국의 법이었던 셈이다. 노예가 주인의 눈에 상처를 입히거나 이를 부러뜨렸다면 당장 죽음에 이르렀을 시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 고대 이스라엘을 최고 선진국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통치의 전형이었다.
우리 사회는 법집행을 피해자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법은 원래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가해자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기독교는 가해자를 죽여 없애는 것으로 끝내려 하지 않는다. 공의를 집행하지만, 그것도 그 가해자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회복은 먼저 피해자의 회복을 전제한다. 공의를 먼저 세운다. 그것이 참된 긍휼의 시작이다. 공의가 세워져야 피해자도 가해자도, 인간답게 회복된다.
만일 변호인들이 설명한대로 선장이나 선원들도 피해자이고 진짜 가해자들은 따로 있는 것이라면, 과연 이 사회는 그 책임자들을 찾아 마땅한 공의를 시행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무고히 죽어간 304명의 생명이 살해된 것을 풀어줄 그 공의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번 사건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판결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고통스런 질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