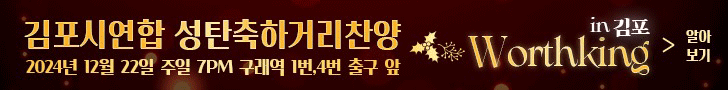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기독일보=장세규 기자] 죠스푸드의 GPS 위치확인 논란과 관련 양대 노총과 인권단체는 직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노동 감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기업이 업무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인권을 경시하는 세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은 전자기기를 통한 동선 파악은 명확한 노동 감시라고 규정했다.
오기형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총무위원은 "전자기기를 통한 동선 파악은 노동강도를 높이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노동 감시는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측이 노측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직원의 동선을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 감시에 해당한다"며 "현재 한국노총은 직원들의 동선을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근 직원의 매장 간 동선이 태블릿PC를 통해 본사로 전송되는 것은 넓게 보면 실시간 감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위치확인 열람, 사후 문제 발생 시로 제한
GPS 위치확인이 꼭 필요하다면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총무위원은 "현재 각 기업에 GPS 위치확인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위치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상시적 열람이 아닌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도 "GPS 위치확인 등은 당연한 것이 아닌 이례적인 사항에만 인정돼야 하고 열람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사측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조합을 통해 사측의 전자 노동 감시를 막을 힘이 있지만 조합이 없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요구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 활동가도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 협약을 맺게 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아무래도 노조가 없다면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전했다.
■ 효율성만 따지는 기업문화 바뀌어야
인권단체들은 효율성만 강조하는 기업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활동가는 "사측은 방문매장, 시작시간, 종료시간 등을 기재,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겠지만 이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사측이 직원의 동의서를 받아 합법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노동 감시이자 정보인권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노동 감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사측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직원이 급여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직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로 당연히 인권 침해"라고 역설했다.
해당 기업이 인권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오 국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해서 을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자 노동 감시와 관련 2007년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규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실태조사를 끝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박성헌 인권위 조사관은 "현행법상 개인의 위치정보는 사전 동의를 받고 수집하고 있으나 노동자 관점에서 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