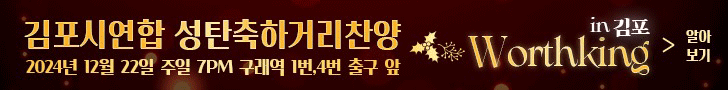법정관리 제도를 이용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정황이 포착됐다. 법정관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조선업체 천해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지난 2005년, ㈜새천년·빛난별 등 실체가 모호한 법인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경영권이 인수됐다.
이 컨소시엄은 3년여 뒤인 2008년,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천해지, 아해 등 계열사 지분을 84억원에 넘긴 뒤 자진 청산해 자취를 감췄다.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이들로부터 84억원에 산 지분은 장부가치만 240억원으로, 거래와 동시에 최소 15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유 전회장이 관여한 차명법인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차명여부와 별개로 회사를 부도낸 기업주가 채무만 탕감 받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행 법정관리 제도의 맹점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인이 부도를 낸 뒤 채무를 탕감받고, 나중에 남은 자산을 헐값에 다시 사들여 이익을 취해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나 사후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경영진을 법정 관리인에 앉히고, 부도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기업주라도 법정관리 신청 전에 재산을 빼돌린 뒤 나중에 싼값에 회사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가 빼돌린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채무탕감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인데, 문제는 재산도피 여부를 당국이나 채권단이 규명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일단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추후에 빼돌린 재산이 발견되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 때문에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 중 법정관리가 가장 강력한 제도지만, 동시에 대주주에게는 가장 '유혹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등이 시작되면 사실상 채권단에게 경영권이 넘어간다. 또 워크아웃하에서는 보유한 주식이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가 차단된다.
반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보전처분이 내려지고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 주도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된다.
법정관리 제도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원래 취지와 달리 경영권 유지나 채무상환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는 이를 가려내야 할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법정관리여부와 관리인을 결정하는 법원이 기준과 잣대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