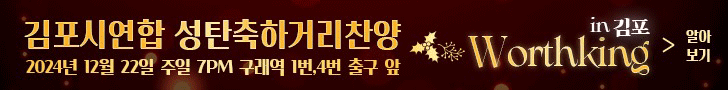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신용 등급(5~6등급)의 약 25%가 저신용 등급(7~10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대 무직자의 신용등급 하락비율이 높았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당시 중신용(5~6등급) 채무자의 평균 25.2%, 고신용(1~4등급) 채무자의 평균 7.2%는 2013년 6월말 현재 저신용(7~10등급)으로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등급으로 떨어진 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상환비율(DTI, 원리금상환액/연소득)을 보면 하락 전 14.2%에서 하락 후 84.8%로 약 6배나 악화됐다. 위기 이전부터 저신용 상태에 있던 채무자의 DTI도 같은 기간동안 44.9%에서 71.4%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고용형태별로는 무직 및 자영업에서 저신용 하락율이 높았다. 20대 중·고신용 채무자 중 27.9%가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가 됐다. ▲30대 16.2% ▲40대 14.0% ▲50대 11.9% ▲60대 9.6%에 비해 높은 수치다.
무직(17.2%) 및 자영업자(11.6%)의 저신용 하락비율은 임금근로자(9.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18.0%) 및 무직(15.4%)으로 전환될 경우 하락률은 큰 폭(각각 8.1%포인트, 5.5%포인트)으로 뛰었다.
저신용 하락자 중 20대는 무직 비중(49.3%), 60대 이상은 자영업 비중(37.0%)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다.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청년실업문제 개선 속도가 더딜 경우 이들 계층의 신용회복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말 기준 20대의 고용률은 56.3%에 불과했다.
이장연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은 "취업 연령이 늦춰지는데다가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20대는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에 비해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저신용 하락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고용이 불확실한 20대에 대한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들이 고금리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몰리고 채무가 늘어나 상환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명예퇴직(30~40대 퇴직) 후 자영업으로 전환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도 여타 계층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지난해 6월말 현재 4.8등급으로 정년퇴직(50대 이상 퇴직) 후 자영업으로 전환한 채무자 및 임금근로 채무자(각각 4.0등급)에 비해 낮다.
또 은행에 빚을 진 사람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저신용 하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은행 채무자의 저신용 하락률은 2009년 6월 8.9%에서 2013년 6월말 4.1%로 낮아진 반면 비은행 채무자는 같은 기간 15.6%에서 19.5%로 올랐다.
금융위기 이후 생계형 자금 목적으로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저신용 하락률도 높았다. 20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이용한 계층의 저신용 하락률은 38.2%로 거액대출(6000만원~1억원)을 받은 채무자들의 17.4%를 크게 상회했다.
이 과장은 "금리 10%대의 신용대출상품 등을 통해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 한다"며 "저신용 채무자의 신용회복 경로를 추적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한 채무자에 대한 분석이 신용회복지원 정책의 효과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