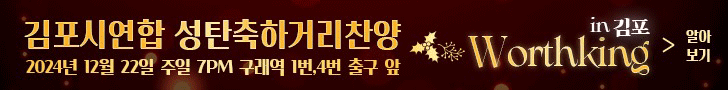예전 같으면 명절을 앞두고 손님들로 북적이던 전통시장이지만 요즘 '추석 특수'는 옛말이다. 젊은 세대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린데다 불황으로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오후 3시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제일골목시장. 몇 년 전만 해도 명절이 다가오면 선물을 사거나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로 활기를 띄던 곳이었지만 올해는 시장 골목이 한산하다.
손님들이 멈춰서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좌판은 절반 남짓. 장사가 되지 않아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인들이 적지 않다. 진열된 물건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가격표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손님들도 눈에 띈다.
올 여름 변덕스런 날씨로 특히 채소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 18㎏들이 사과 1박스는 지난해 추석때 8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23만원대로 치솟았다. 단감 한짝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배추는 3포기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열무 한 단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육류 가격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LA 갈비는 급증한 중국 수요 탓에 수입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30% 이상 올랐다. 찹쌀 한 말 가격은 7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뛰면서 송편이나 한과 가격이 덩달아 올랐다.
이옥실(63·여)씨는 "시장에 올 때마다 어제 물가와 오늘 물가가 다른 느낌이고 특히 과일값이 많이 올라 제사상 차리는 게 걱정"이라며 "최대한 차리는 음식의 양을 줄이고 값이 많이 오른 나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정자(70·여)씨는 "채소고 과일이고 다 비싸졌다"며 "손자들 때문에 돈을 좀 쓰려고 했는데 시장에 와서 보니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손님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청과물 상점을 운영하는 이상환(54)씨는 "손님이 작년의 절반도 안된다"며 "몇 년 전에는 명절 앞두고 사과가 200짝씩 나가곤 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2짝 정도 팔리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떡집을 운영하는 유민자(45·여)씨는 "떡을 주문하는데서부터 주머니 사정이 안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쌀 한말 정도 분량을 맞추겠다는 주문은 이제 거의 없고 추석 제사상에 올릴 정도만 사가는 손님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을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입하기 시작한 것도 상인들에게는 큰 타격이다.
청과물 상점을 운영하는 배숙희(55·여)씨는 "예전에는 은행 같은 곳에서 고객이나 직원들에게 줄 선물용으로 대량으로 사갔는데 요즘엔 다 백화점에서 사는 모양"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크게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실제와 다르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같은날 찾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과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경동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배대용(57)씨는 "생선 가격은 올랐는데 소비자 가격은 비슷하게 팔고 있다"며 "그런데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우려했다.
추석 선물을 사러 나온 주부 권모(53·여)씨는 상점에서 과일 가격을 유심히 지켜보다 이내 발길을 돌렸다. 권씨는 "더 싸고 좋은 것을 사려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지만 저렴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기 등 수산물은 가격이 오히려 내렸지만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로 직격타를 맞았다.
망원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종(53)씨는 "추석에는 조기가 많이 팔려야 하는데 방사능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먹어도 되냐'고 여러번 물어본다"며 "태평양에서 잡아 얼린 것인데도 잘 안 사간다"고 말했다.
이씨는 "올해는 값을 내려도 잘 안팔린다"며 "큰 것은 3마리, 작은 것은 10마리에 만 원을 받다가 최근에는 4마리, 12마리로 늘렸는데도 거의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